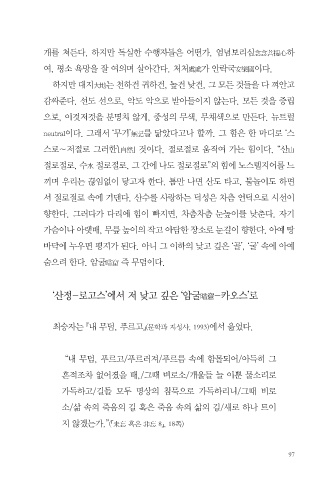Page 97 - 고경 - 2018년 7월호 Vol. 63
P. 97
개를 쳐든다. 하지만 독실한 수행자들은 어떤가. 염념보리심念念菩提心하
여, 평소 욕망을 잘 여의며 살아간다. 처처處處가 안락국安樂國이다.
하지만 대지大地는 천하건 귀하건, 높건 낮건, 그 모든 것들을 다 껴안고
감싸준다. 선도 선으로, 악도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중립
으로, 이것저것을 분명치 않게, 중성의 무색, 무채색으로 만든다. 뉴트럴
neutral이다. 그래서 ‘무기’無記를 닮았다고나 할까. 그 힘은 한 마디로 ‘스
스로∼저절로 그러한’[自然] 것이다. 절로절로 움직여 가는 힘이다. “산山
절로절로, 수水 절로절로, 그 간에 나도 절로절로”의 힘에 노스텔지어를 느
끼며 우리는 끊임없이 닿고자 한다. 틈만 나면 산도 타고, 물놀이도 하면
서 절로절로 속에 기댄다. 산수를 사랑하는 덕성은 차츰 언덕으로 시선이
향한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차츰차츰 눈높이를 낮춘다. 자기
가슴이나 아랫배, 무릎 높이의 작고 아담한 장소로 눈길이 향한다. 아예 땅
바닥에 누우면 평지가 된다. 아니 그 이하의 낮고 깊은 ‘골’, ‘굴’ 속에 아예
숨으려 한다. 암굴暗窟 즉 무덤이다.
‘산정-로고스’에서 저 낮고 깊은 ‘암굴暗窟-카오스’로
최승자는 『내 무덤, 푸르고』(문학과 지성사, 1993)에서 읊었다.
“내 무덤, 푸르고/푸르러져/푸르름 속에 함몰되어/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그때 비로소/개울들 늘 이뿐 물소리로
가득하고/길들 모두 명상의 침묵으로 가득하리니/그때 비로
소/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새로 하나 트이
지 않겠는가.”(「未忘 혹은 非忘 8」, 18쪽)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