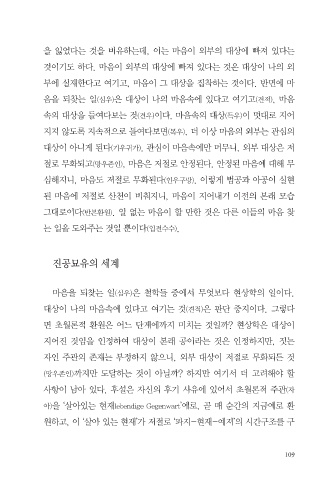Page 111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111
을 잃었다는 것을 비유하는데, 이는 마음이 외부의 대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마음이 외부의 대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상이 나의 외
부에 실재한다고 여기고, 마음이 그 대상을 집착하는 것이다. 반면에 마
음을 되찾는 일(심우)은 대상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여기고(견적), 마음
속의 대상을 들여다보는 것(견우)이다. 마음속의 대상(득우)이 멋대로 지어
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목우), 더 이상 마음의 외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기우귀가). 관심이 마음속에만 머무니, 외부 대상은 저
절로 무화되고(망우존인), 마음은 저절로 안정된다. 안정된 마음에 대해 무
심해지니, 마음도 저절로 무화된다(인우구망). 이렇게 법공과 아공이 실현
된 마음에 저절로 산천이 비춰지니, 마음이 지어내기 이전의 본래 모습
그대로이다(반본환원). 일 없는 마음이 할 만한 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 찾
는 일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입전수수).
진공묘유의 세계
마음을 되찾는 일(심우)은 철학들 중에서 무엇보다 현상학의 일이다.
대상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여기는 것(견적)은 판단 중지이다. 그렇다
면 초월론적 환원은 어느 단계에까지 미치는 것일까? 현상학은 대상이
지어진 것임을 인정하여 대상이 본래 공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짓는
자인 주관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으니, 외부 대상이 저절로 무화되든 것
(망우존인)까지만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후설은 자신의 후기 사유에 있어서 초월론적 주관(자
아)을 ‘살아있는 현재lebendige Gegenwart’에로, 곧 매 순간의 지금에로 환
원하고, 이 ‘살아 있는 현재’가 저절로 ‘파지-현재-예지’의 시간구조를 구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