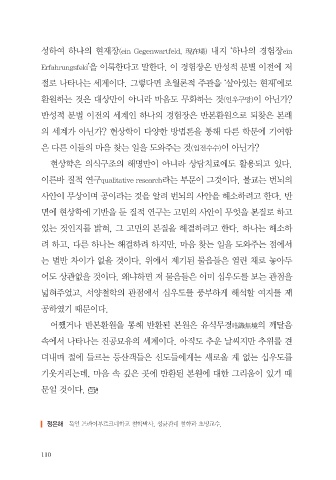Page 112 - 고경 - 2019년 3월호 Vol. 71
P. 112
성하여 하나의 현재장(ein Gegenwartfeld, 現在場) 내지 ‘하나의 경험장ein
Erfahrungsfeld’을 이룩한다고 말한다. 이 경험장은 반성적 분별 이전에 저
절로 나타나는 세계이다. 그렇다면 초월론적 주관을 ‘살아있는 현재’에로
환원하는 것은 대상만이 아니라 마음도 무화하는 것(인우구망)이 아닌가?
반성적 분별 이전의 세계인 하나의 경험장은 반본환원으로 되찾은 본래
의 세계가 아닌가? 현상학이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다른 학문에 기여함
은 다른 이들의 마음 찾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전수수)이 아닌가?
현상학은 의식구조의 해명만이 아니라 상담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라는 부문이 그것이다. 불교는 번뇌의
사안이 무상이며 공이라는 것을 알려 번뇌의 사안을 해소하려고 한다. 반
면에 현상학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는 고민의 사안이 무엇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 그 고민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는 해소하
려 하고, 다른 하나는 해결하려 하지만, 마음 찾는 일을 도와주는 점에서
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제기된 물음들은 열린 채로 놓아두
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물음들은 이미 십우도를 보는 관점을
넓혀주었고,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십우도를 풍부하게 해석할 여지를 제
공하였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반본환원을 통해 반환된 본원은 유식무경唯識無境의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진공묘유의 세계이다. 아직도 추운 날씨지만 추위를 견
뎌내며 절에 들르는 등산객들은 신도들에게는 새로울 게 없는 십우도를
기웃거리는데, 마음 속 깊은 곳에 반환된 본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정은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성균관대 철학과 초빙교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