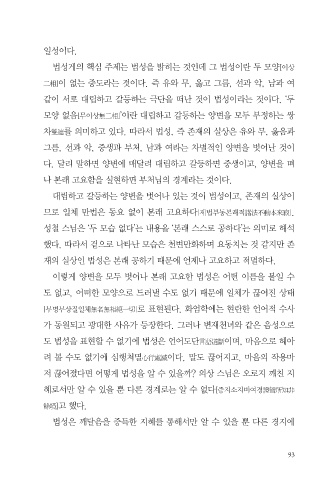Page 95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95
일성이다.
법성게의 핵심 주제는 법성을 밝히는 것인데 그 법성이란 두 모양[이상
二相]이 없는 중도라는 것이다. 즉 유와 무, 옳고 그름, 선과 악, 남과 여
같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극단을 떠난 것이 법성이라는 것이다. ‘두
모양 없음[무이상無二相]’이란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변을 모두 부정하는 쌍
차雙遮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법성, 즉 존재의 실상은 유와 무,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중생과 부처, 남과 여라는 차별적인 양변을 벗어난 것이
다. 달리 말하면 양변에 매달려 대립하고 갈등하면 중생이고, 양변을 떠
나 본래 고요함을 실현하면 부처님의 경계라는 것이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변을 벗어나 있는 것이 법성이고, 존재의 실상이
므로 일체 만법은 동요 없이 본래 고요하다[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성철 스님은 ‘두 모습 없다’는 내용을 ‘본래 스스로 공하다’는 의미로 해석
했다. 따라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천변만화하며 요동치는 것 같지만 존
재의 실상인 법성은 본래 공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요하고 적멸하다.
이렇게 양변을 모두 벗어나 본래 고요한 법성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도 없고,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일체가 끊어진 상태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로 표현된다. 화엄학에는 현란한 언어적 수사
가 동원되고 광대한 사유가 등장한다. 그러나 변재천녀와 같은 음성으로
도 법성을 표현할 수 없기에 법성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마음으로 헤아
려 볼 수도 없기에 심행처멸心行處滅이다. 말도 끊어지고, 마음의 작용마
저 끊어졌다면 어떻게 법성을 알 수 있을까? 의상 스님은 오로지 깨친 지
혜로서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경계로는 알 수 없다[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
餘境]고 했다.
법성은 깨달음을 증득한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경지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