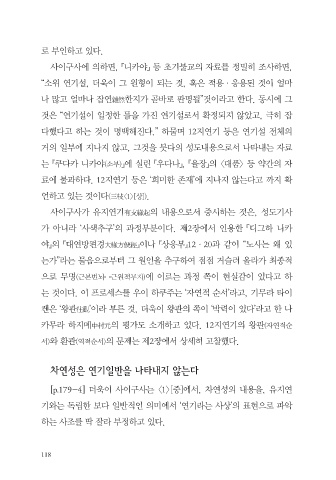Page 120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20
로 부인하고 있다.
사이구사에 의하면, 『니카야』 등 초기불교의 자료를 정밀히 조사하면,
“소위 연기설, 더욱이 그 원형이 되는 것, 혹은 적용·응용된 것이 얼마
나 많고 얼마나 잡연雜然한지가 곧바로 판명될”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그
것은 “연기설이 일정한 틀을 가진 연기설로서 확정되지 않았고, 극히 잡
다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하물며 12지연기 등은 연기설 전체의
거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붓다의 성도내용으로서 나타내는 자료
는 『쿠다카 니카야(소부)』에 실린 『우다나』, 『율장』의 <대품> 등 약간의 자
료에 불과하다. 12지연기 등은 ‘희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확
언하고 있는 것이다(三枝<1>[상]).
사이구사가 유지연기有支緣起의 내용으로서 중시하는 것은, 성도기사
가 아니라 ‘사색추구’의 과정부분이다. 제2장에서 인용한 『디그하 니카
야』의 『대연방편경大緣方便經』이나 『상응부』12·20과 같이 “노사는 왜 있
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그 원인을 추구하여 점점 거슬러 올라가 최종적
으로 무명(근본번뇌↔근원적무지)에 이르는 과정 쪽이 현실감이 있다고 하
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우이 하쿠주는 ‘자연적 순서’라고, 기무라 타이
켄은 ‘왕관往觀’이라 부른 것, 더욱이 왕관의 쪽이 ‘박력이 있다’라고 한 나
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평가도 소개하고 있다. 12지연기의 왕관(자연적순
서)와 환관(역적순서)의 문제는 제2장에서 상세히 고찰했다.
차연성은 연기일반을 나타내지 않는다
[p.179-4] 더욱이 사이구사는 <1>[중]에서, 차연성의 내용을, 유지연
기와는 독립한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기라는 사상’의 표현으로 파악
하는 사조를 딱 잘라 부정하고 있다.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