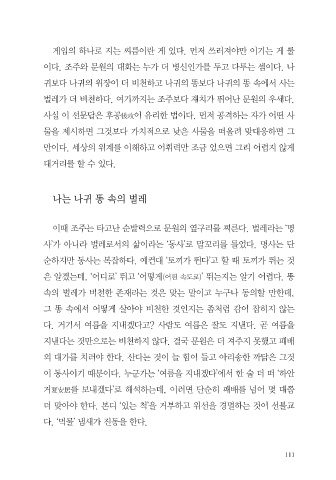Page 113 - 고경 - 2019년 10월호 Vol. 78
P. 113
게임의 하나로 지는 씨름이란 게 있다. 먼저 쓰러져야만 이기는 게 룰
이다. 조주와 문원의 대화는 누가 더 병신인가를 두고 다투는 셈이다. 나
귀보다 나귀의 위장이 더 비천하고 나귀의 똥보다 나귀의 똥 속에서 사는
벌레가 더 비천하다. 여기까지는 조주보다 재치가 뛰어난 문원의 우세다.
사실 이 선문답은 후공後攻이 유리한 법이다. 먼저 공격하는 자가 어떤 사
물을 제시하면 그것보다 가치적으로 낮은 사물을 떠올려 맞대응하면 그
만이다. 세상의 위계를 이해하고 어휘력만 조금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대거리를 할 수 있다.
나는 나귀 똥 속의 벌레
이때 조주는 타고난 순발력으로 문원의 옆구리를 찌른다. 벌레라는 ‘명
사’가 아니라 벌레로서의 삶이라는 ‘동사’로 말꼬리를 틀었다. 명사는 단
순하지만 동사는 복잡하다. 예컨대 ‘토끼가 뛴다’고 할 때 토끼가 뛰는 것
은 알겠는데, ‘어디로’ 뛰고 ‘어떻게(어떤 속도로)’ 뛰는지는 알기 어렵다. 똥
속의 벌레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은 맞는 말이고 누구나 동의할 만한데,
그 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비천한 것인지는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
다. 거기서 여름을 지내겠다고? 사람도 여름은 잘도 지낸다. 곧 여름을
지낸다는 것만으로는 비천하지 않다. 결국 문원은 더 져주지 못했고 패배
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산다는 것이 늘 힘이 들고 아리송한 까닭은 그것
이 동사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여름을 지내겠다’에서 한 술 더 떠 ‘하안
거夏安居를 보내겠다’로 해석하는데, 이러면 단순히 패배를 넘어 몇 대쯤
더 맞아야 한다. 본디 ‘있는 척’을 거부하고 위선을 경멸하는 것이 선불교
다. ‘먹물’ 냄새가 진동을 한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