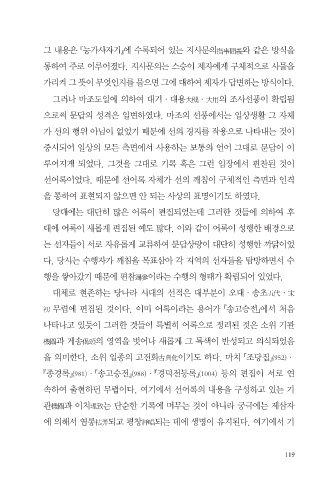Page 121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21
그 내용은 『능가사자기』에 수록되어 있는 지사문의指事問義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지사문의는 스승이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사물을
가리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에 대하여 제자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마조도일에 의하여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조사선풍이 확립됨
으로써 문답의 성격은 일변하였다. 마조의 선풍에서는 일상생활 그 자체
가 선의 행위 아님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 경지를 작용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시되어 일상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 그대로 문답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 혹은 그런 입장에서 편찬된 것이
선어록이었다. 때문에 선어록 자체가 선의 깨침이 구체적인 측면과 인격
을 통하여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상의 표명이기도 하였다.
당대에는 대단히 많은 어록이 편집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후
대에 어록이 새롭게 편집된 예도 많다. 이와 같이 어록이 성행한 배경으로
는 선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여 문답상량이 대단히 성행한 까닭이었
다. 당시는 수행자가 깨침을 목표삼아 각 지역의 선자들을 탐방하면서 수
행을 쌓아갔기 때문에 편참遍參이라는 수행의 형태가 확립되어 있었다.
대체로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선적은 대부분이 오대·송초五代·宋
初 무렵에 편집된 것이다. 이미 어록이라는 용어가 『송고승전』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어록으로 정리된 것은 소위 기관
機關과 게송偈頌의 영역을 벗어나 새롭게 그 특색이 반성되고 의식되었음
을 의미한다. 소위 일종의 고전화古典化이기도 하다. 마치 『조당집』(952)·
『종경록』(981)·『송고승전』(988)·『경덕전등록』(1004) 등의 편집이 서로 연
속하여 출현하던 무렵이다. 여기에서 선어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기
관機關과 이치理致는 단순한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제삼자
에 의해서 염롱拈弄되고 평창評唱되는 데에 생명이 유지된다. 여기에서 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