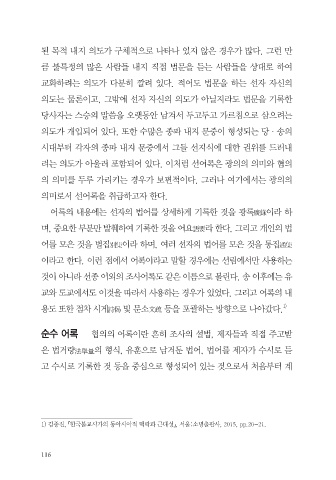Page 118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18
된 목적 내지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만
큼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 내지 직접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교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적어도 법문을 하는 선자 자신의
의도는 물론이고, 그밖에 선자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법문을 기록한
당사자는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남겨서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종파 내지 문중이 형성되는 당·송의
시대부터 각자의 종파 내지 문중에서 그들 선지식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
려는 의도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선어록은 광의의 의미와 협의
의 의미를 두루 가리키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광의의
의미로서 선어록을 취급하고자 한다.
어록의 내용에는 선자의 법어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광록廣錄이라 하
며,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기록한 것을 어요語要라 한다. 그리고 개인의 법
어를 모은 것을 별집別集이라 하며, 여러 선자의 법어를 모은 것을 통집通集
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어록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선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종 이외의 조사어록도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송 이후에는 유
교와 도교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어록의 내
1)
용도 또한 점차 시게詩偈 및 문소文疏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순수 어록 협의의 어록이란 흔히 조사의 설법, 제자들과 직접 주고받
은 법거량法擧量의 형식, 유훈으로 남겨둔 법어, 법어를 제자가 수시로 듣
고 수시로 기록한 것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
1) 김종진, 『한국불교시가의 동아시아적 맥락과 근대성』, 서울:소명출판사, 2015, pp.20-21.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