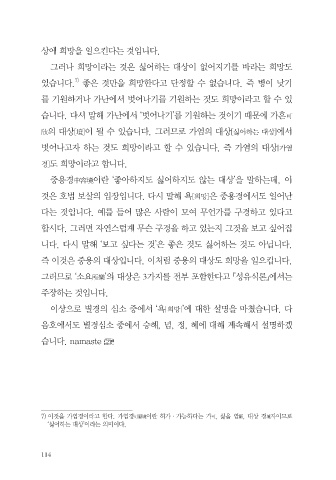Page 116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16
상에 희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대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희망도
7)
있습니다. 좋은 것만을 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병이 낫기
를 기원하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흔可
欣의 대상[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염의 대상[싫어하는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염의 대상[가염
경]도 희망이라고 합니다.
중용경中容境이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대상’을 말하는데, 이
것은 호법 보살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욕[희망]은 중용경에서도 일어난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구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집
니다. 다시 말해 ‘보고 싶다는 것’은 좋은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이것은 중용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중용의 대상도 희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소요所樂’의 대상은 3가지를 전부 포함한다고 『성유식론』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별경의 심소 중에서 ‘욕[희망]’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
음호에서도 별경심소 중에서 승해, 념, 정, 혜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겠
습니다. namaste
7) 이것을 가염경이라고 한다. 가염경可厭境이란 허가·가능하다는 가可, 싫을 염厭, 대상 경境자이므로
‘싫어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