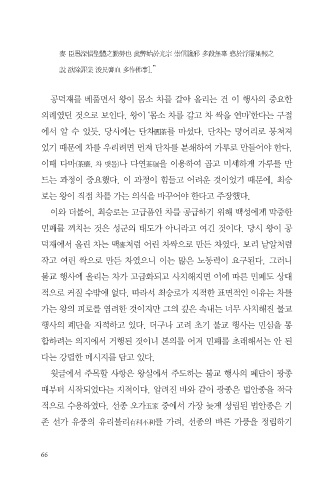Page 68 - 고경 - 2020년 4월호 Vol. 84
P. 68
麥 臣愚深惜聖體之勤勞也 此弊始於光宗 崇信讒邪 多殺無辜 惑於浮屠果報之
說 欲除罪業 浚民膏血 多作佛事].”
공덕재를 베풀면서 왕이 몸소 차를 갈아 올리는 건 이 행사의 중요한
의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이 ‘몸소 차를 갈고 차 싹을 연마’한다는 구절
에서 알 수 있듯, 당시에는 단차團茶를 마셨다. 단차는 덩어리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차를 우리려면 먼저 단차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다마(茶磨, 차 맷돌)나 다연茶碾을 이용하여 곱고 미세하게 가루를 만
드는 과정이 중요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최승
로는 왕이 직접 차를 가는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승로는 고급품인 차를 공급하기 위해 백성에게 막중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성군의 태도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당시 왕이 공
덕재에서 올린 차는 맥麥처럼 어린 차싹으로 만든 차였다. 보리 낱알처럼
작고 여린 싹으로 만든 차였으니 이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된다. 그러니
불교 행사에 올리는 차가 고급화되고 사치해지면 이에 따른 민폐도 상대
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승로가 지적한 표면적인 이유는 차를
가는 왕의 피로를 염려한 것이지만 그의 깊은 속내는 너무 사치해진 불교
행사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고려 초기 불교 행사는 민심을 통
합하려는 의지에서 거행된 것이니 본의를 어겨 민폐를 초래해서는 안 된
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윗글에서 주목할 사항은 왕실에서 주도하는 불교 행사의 폐단이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종은 법안종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였다. 선종 오가五家 중에서 가장 늦게 성립된 법안종은 기
존 선가 유풍의 유리불리有利不利를 가려, 선종의 바른 가풍을 정립하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