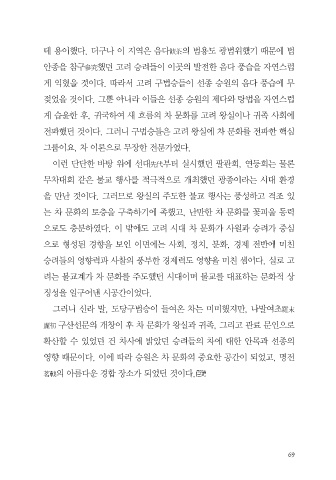Page 71 - 고경 - 2020년 4월호 Vol. 84
P. 71
데 용이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음다飮茶의 범용도 광범위했기 때문에 법
안종을 참구參究했던 고려 승려들이 이곳의 발전한 음다 풍습을 자연스럽
게 익혔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구법승들이 선종 승원의 음다 풍습에 무
젖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선종 승원의 제다와 탕법을 자연스럽
게 습윤한 후, 귀국하여 새 흐름의 차 문화를 고려 왕실이나 귀족 사회에
전파했던 것이다. 그러니 구법승들은 고려 왕실에 차 문화를 전파한 핵심
그룹이요, 차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가였다.
이런 단단한 바탕 위에 선대先代부터 실시했던 팔관회, 연등회는 물론
무차대회 같은 불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했던 광종이라는 시대 환경
을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왕실의 주도한 불교 행사는 풍성하고 격조 있
는 차 문화의 토층을 구축하기에 족했고, 난만한 차 문화를 꽃피울 동력
으로도 충분하였다. 이 밖에도 고려 시대 차 문화가 사원과 승려가 중심
으로 형성된 경향을 보인 이면에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전반에 미친
승려들의 영향력과 사찰의 풍부한 경제력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실로 고
려는 불교계가 차 문화를 주도했던 시대이며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
징성을 일구어낸 시공간이었다.
그러니 신라 말, 도당구법승이 들여온 차는 미미했지만, 나말여초羅末
麗初 구산선문의 개창이 후 차 문화가 왕실과 귀족, 그리고 관료 문인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건 차사에 밝았던 승려들의 차에 대한 안목과 선종의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원은 차 문화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명전
茗戰의 아름다운 경합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