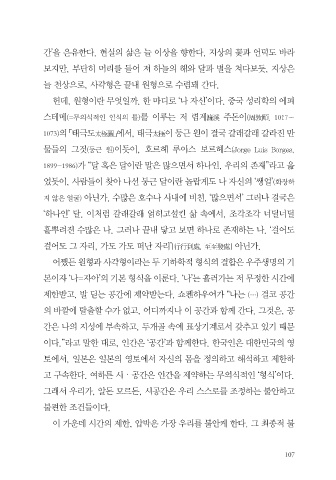Page 109 - 고경 - 2018년 8월호 Vol. 64
P. 109
간’을 은유한다. 현실의 삶은 늘 이상을 향한다. 지상의 꽃과 언덕도 바라
보지만, 부단히 머리를 들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쳐다보듯, 지상은
늘 천상으로, 사각형은 끝내 원형으로 수렴돼 간다.
헌데, 원형이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나 자신’이다. 중국 성리학의 에피
스테메(=무의식적인 인식의 틀)를 이루는 저 렴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
1073)의 「태극도太極圖」에서, 태극太極이 둥근 원이 결국 갈래갈래 갈라진 만
물들의 그것(둥근 원)이듯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가 “달 혹은 달이란 말은 많으면서 하나인, 우리의 존재”라고 읊
었듯이, 사람들이 찾아 나선 둥근 달이란 놀랍게도 나 자신의 ‘쌩얼’(화장하
지 않은 얼굴) 아닌가. 수많은 호수나 시내에 비친, ‘많으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인’ 달. 이처럼 갈래갈래 얽히고설킨 삶 속에서, 조각조각 너덜너덜
흩뿌려진 수많은 나. 그러나 끝내 닿고 보면 하나로 존재하는 나. ‘걸어도
걸어도 그 자리, 가도 가도 떠난 자리’[行行到處, 至至發處] 아닌가.
어쨌든 원형과 사각형이라는 두 기하학적 형식의 결합은 우주생명의 기
본이자 ‘나=자아’의 기본 형식을 이룬다. ‘나’는 흘러가는 저 무정한 시간에
제한받고, 발 딛는 공간에 제약받는다. 쇼펜하우어가 “나는 (…) 결코 공간
의 바깥에 탈출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이 공간과 함께 간다. 그것은, 공
간은 나의 지성에 부속하고, 두개골 속에 표상기계로서 갖추고 있기 때문
이다.”라고 말한 대로, 인간은 ‘공간’과 함께한다.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영
토에서, 일본은 일본의 영토에서 자신의 몸을 정의하고 해석하고 제한하
고 구속한다. 여하튼 시・공간은 인간을 제약하는 무의식적인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시공간은 우리 스스로를 조정하는 불안하고
불편한 조건들이다.
이 가운데 시간의 제한, 압박은 가장 우리를 불안케 한다. 그 최종적 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