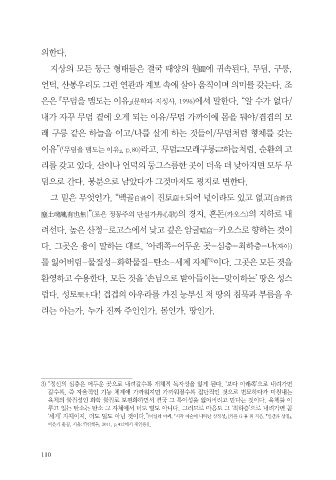Page 112 - 고경 - 2018년 8월호 Vol. 64
P. 112
의한다.
지상의 모든 둥근 형태들은 결국 태양의 원圓에 귀속된다. 무덤, 구릉,
언덕, 산봉우리도 그런 연관과 계보 속에 살아 움직이며 의미를 갖는다. 조
은은 『무덤을 맴도는 이유』(문학과 지성사, 1996)에서 말한다. “알 수가 없다/
내가 자꾸 무덤 곁에 오게 되는 이유/무덤 가까이에 몸을 둬야/겹겹의 모
래 구릉 같은 하늘을 이고/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무덤처럼 형체를 갖는
이유”(『무덤을 맴도는 이유』, p.80)라고. 무덤⇄모래구릉⇄하늘처럼, 순환의 고
리를 갖고 있다. 산이나 언덕의 둥그스름한 곳이 더욱 더 낮아지면 모두 무
덤으로 간다. 봉분으로 남았다가 그것마저도 평지로 변한다.
그 밑은 무엇인가.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白骨爲
塵土魂魄有也無]”(포은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의 경지, 혼돈(카오스)의 지하로 내
려선다. 높은 산정-로고스에서 낮고 깊은 암굴暗窟-카오스로 향하는 것이
다. 그곳은 융이 말하는 대로, ‘아래쪽-어두운 곳-심층-최하층-나(자아)
를 잃어버림-물질성-화학물질-탄소-세계 자체’ 이다. 그곳은 모든 것을
3)
환영하고 수용한다. 모든 것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맞이하는’ 땅은 성스
럽다. 성토聖土다! 겹겹의 아우라를 가진 눈부신 저 땅의 침묵과 부름을 우
리는 아는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몸인가. 땅인가.
3) “정신의 심층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수록 개체적 독자성을 잃게 된다. ‘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즉 자율적인 기능 체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단적인 것으로 변모하다가 마침내는
육체의 물질성인 화학 물질로 보편화하면서 결국 그 특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육체를 이
루고 있는 탄소는 탄소 그 자체에서 더도 덜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그 ‘최하층’으로 내려가면 곧
‘세계’ 자체이지, 더도 덜도 아닌 것이다.”(아닐라 야페, 「시각 예술에 나타난 상징성」 [카를 G 융 외 지음, 『인간과 상징』,
이윤기 옮김, 서울:열린책들, 2011, p.412에서 재인용]).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