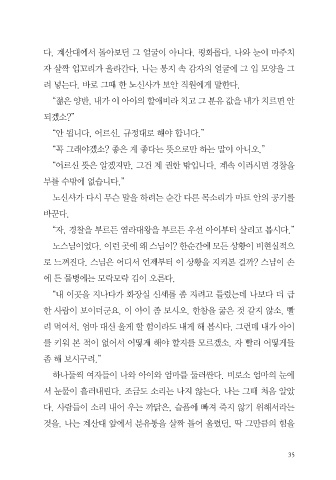Page 37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P. 37
다. 계산대에서 돌아보던 그 얼굴이 아니다. 평화롭다. 나와 눈이 마주치
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다. 나는 봉지 속 감자의 얼굴에 그 입 모양을 그
려 넣는다. 바로 그때 한 노신사가 보안 직원에게 말한다.
“젊은 양반, 내가 이 아이의 할애비라 치고 그 분유 값을 내가 치르면 안
되겠소?”
“안 됩니다, 어르신.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꼭 그래야겠소? 좋은 게 좋다는 뜻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오.”
“어르신 뜻은 알겠지만, 그건 제 권한 밖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신사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마트 안의 공기를
바꾼다.
“자, 경찰을 부르든 염라대왕을 부르든 우선 아이부터 살리고 봅시다.”
노스님이었다. 이런 곳에 왜 스님이?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
로 느껴진다. 스님은 어디서 언제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걸까? 스님이 손
에 든 물병에는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내 이곳을 지나다가 화장실 신세를 좀 지려고 들렀는데 나보다 더 급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이 아이 좀 보시오. 한참을 굶은 것 같지 않소. 빨
리 먹여서, 엄마 대신 울게 할 힘이라도 내게 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아이
를 키워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소. 자 빨리 어떻게들
좀 해 보시구려.”
하나둘씩 여자들이 나와 아이와 엄마를 둘러싼다. 비로소 엄마의 눈에
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조금도 소리는 나지 않는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
다. 사람들이 소리 내어 우는 까닭은, 슬픔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나는 계산대 앞에서 분유통을 살짝 들어 올렸던, 딱 그만큼의 힘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