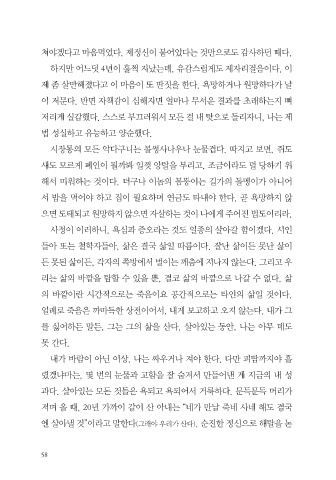Page 60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P. 60
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제정신이 붙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때다.
하지만 어느덧 4년이 훌쩍 지났는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제 좀 살만해졌다고 이 마음이 또 딴짓을 한다. 욕망하거나 원망하다가 날
이 저문다. 반면 자책감이 심해지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
저리게 실감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자니, 나는 제
법 성실하고 유능하고 양순했다.
시장통의 모든 악다구니는 볼썽사나우나 눈물겹다. 따지고 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 폐인이 될까봐 일껏 앙탈을 부리고, 조금이라도 덜 당하기 위
해서 미워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놈의 몸뚱이는 길가의 돌멩이가 아니어
서 밥을 먹어야 하고 집이 필요하며 연금도 타내야 한다. 곧 욕망하지 않
으면 도태되고 원망하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법도이리라.
사정이 이러하니, 욕심과 증오라는 것도 일종의 살아갈 힘이겠다. 시인
들아 또는 철학자들아, 삶은 결국 삶일 따름이다. 잘난 삶이든 못난 삶이
든 못된 삶이든, 각자의 쪽방에서 벌이는 깨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
리는 삶의 바깥을 탐할 수 있을 뿐, 결코 삶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삶
의 바깥이란 시간적으로는 죽음이요 공간적으로는 타인의 삶일 것이다.
일례로 죽음은 까마득한 상전이어서, 내게 보고하고 오지 않는다. 내가 그
를 싫어하든 말든, 그는 그의 삶을 산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아무 데도
못 간다.
내가 바람이 아닌 이상, 나는 싸우거나 져야 한다. 다만 피땀까지야 흘
렸겠냐마는, 몇 번의 눈물과 고함을 잘 숨겨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내 성
과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욕되고 욕되어서 거룩하다. 문득문득 머리가
저며 올 때, 20년 가까이 같이 산 아내는 “네가 만날 죽네 사네 해도 결국
엔 살아낼 것”이라고 말한다(그래야 우리가 산다). 순진한 정신으로 해탈을 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