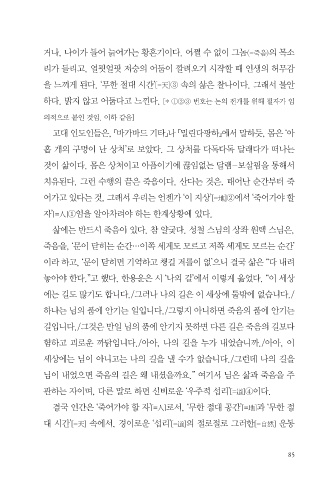Page 87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P. 87
거나,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황혼기이다. 어쩔 수 없이 그놈(=죽음)의 목소
리가 들리고, 얼핏얼핏 저승의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할 때 인생의 허무감
을 느끼게 된다. ‘무한 절대 시간’[=天]③ 속의 삶은 찰나이다. 그래서 불안
하다. 밝지 않고 어둡다고 느낀다. [ ①②③ 번호는 논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임
*
의적으로 붙인 것임. 이하 같음]
고대 인도인들은, 『바가바드 기타』나 『밀린다팡하』에서 말하듯, 몸은 ‘아
홉 개의 구멍이 난 상처’로 보았다. 그 상처를 다독다독 달래다가 떠나는
것이 삶이다. 몸은 상처이고 아픔이기에 끊임없는 달램-보살핌을 통해서
치유된다. 그런 수행의 끝은 죽음이다. 산다는 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
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지상’[=地]②에서 ‘죽어가야 할
자’[=人]①임을 알아차려야 하는 한계상황에 있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참 얄궂다. 성철 스님의 상좌 원택 스님은,
죽음을, ‘문이 닫히는 순간…이쪽 세계도 모르고 저쪽 세계도 모르는 순간’
이라 하고, ‘문이 닫히면 기억하고 챙길 겨를이 없’으니 결국 삶은 “다 내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용운은 시 ‘나의 길’에서 이렇게 읊었다. “이 세상
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아아, 나의 길을 누가 내었습니까./아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여기서 님은 삶과 죽음을 주
관하는 자이며, 다른 말로 하면 신비로운 ‘우주적 섭리’[=道]④이다.
결국 인간은 ‘죽어가야 할 자’[=人]로서, ‘무한 절대 공간’[=地]과 ‘무한 절
대 시간’[=天] 속에서, 경이로운 ‘섭리’[=道]의 절로절로 그러한[=自然] 운동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