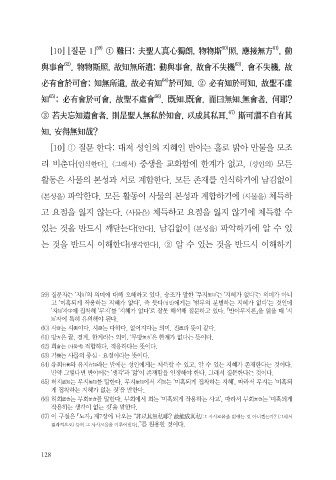Page 130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30
61)
60)
59)
[10] [질문 1] ① 難曰: 夫聖人真心獨朗, 物物斯 照, 應接無方 , 動
63)
62)
與事會 . 物物斯照, 故知無所遺; 動與事會, 故會不失機 . 會不失機, 故
64)
必有會於可會; 知無所遺, 故必有知 於可知. ② 必有知於可知, 故聖不虛
66)
65)
知 ; 必有會於可會, 故聖不虛會 . 既知、既會, 而曰無知、無會者, 何耶?
67)
③ 若夫忘知遺會者, 則是聖人無私於知會, 以成其私耳. 斯可謂不自有其
知, 安得無知哉?
[10] ① 질문 한다: 대저 성인의 지혜인 반야는 홀로 밝아 만물을 모조
리 비춘다[인식한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함에 한계가 없고, (성인의) 모든
활동은 사물의 본성과 서로 계합한다. 모든 존재를 인식하기에 남김없이
(본성을) 파악한다. 모든 활동이 사물의 본성과 계합하기에 (사물을) 체득하
고 요점을 잃지 않는다. (사물을) 체득하고 요점을 잃지 않기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다[안다]. 남김없이 (본성을) 파악하기에 알 수 있
는 것을 반드시 이해한다[생각한다]. ② 알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기
59) 질문자는 ‘지知’의 의미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승조가 말한 ‘무지無知’는 ‘지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
고 ‘미혹되게 작용하는 지혜가 없다’, 즉 붓다(성인)에게는 ‘범부의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인데
‘지知’자字에 집착해 ‘무지’를 ‘지혜가 없다’로 잘못 해석해 질문하고 있다. 「반야무지론」을 읽을 때 ‘지
知’자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60) 사斯는 시澌이다. 시凘는 다하다, 없어지다는 의미. 진盡과 뜻이 같다.
61) 방方은 끝, 경계, 한계라는 의미. ‘무방無方’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62) 회會는 (사물에) 적합하다, 적응하다는 뜻이다.
63) 기機는 사물의 중심·요점이라는 뜻이다.
64) 유회有會와 유지有知라는 말에는 성인에게는 체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반야에는 ‘생각’과 ‘앎’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이다.
65) 허지虛知는 무지無知를 말한다. 무지無知에서 지知는 ‘미혹되게 집착하는 지혜’, 따라서 무지는 ‘미혹되
게 집착하는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한다.
66) 허회虛會는 무회無會를 말한다. 무회에서 회는 ‘미혹되게 작용하는 사고’, 따라서 무회無會는 ‘미혹되게
작용하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한다.
67) 이 구절은 『노자』 제7장에 나오는 “非以其無私耶? 故能成其私[그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루어낸다].”를 원용한 것이다.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