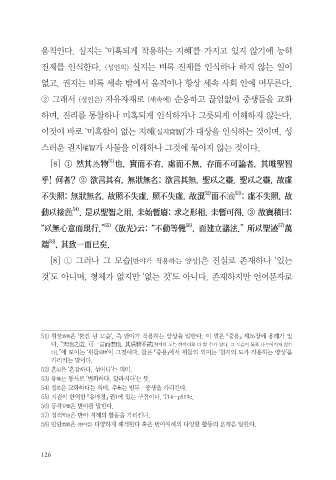Page 128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28
움직인다. 실지는 ‘미혹되게 작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능히
진제를 인식한다. (성인의) 실지는 비록 진제를 인식하나 하지 않는 일이
없고, 권지는 비록 세속 밖에서 움직이나 항상 세속 사회 안에 머무른다.
② 그래서 (성인은) 자유자재로 (세속에) 순응하고 끊임없이 중생들을 교화
하며, 진리를 통찰하나 미혹되게 인식하거나 그릇되게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미혹함이 없는 지혜[실지實智]’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며, 성
스러운 권지權智가 사물을 이해하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51)
[8] ① 然其為物 也, 實而不有, 虛而不無, 存而不可論者, 其唯聖智
乎! 何者? ② 欲言其有, 無狀無名; 欲言其無, 聖以之靈. 聖以之靈, 故虛
53)
52)
不失照; 無狀無名, 故照不失虛. 照不失虛, 故混 而不渝 ; 虛不失照, 故
54)
動以接麁 . 是以聖智之用, 未始暫廢; 求之形相, 未暫可得. ③ 故寶積曰:
55)
57)
56)
“以無心意而現行.” 《放光》云: “不動等覺 , 而建立諸法.” 所以聖迹 萬
58)
端 , 其致一而已矣.
[8] ① 그러나 그 모습[반야가 작용하는 양상]은 진실로 존재하나 ‘있는
것’도 아니며, 형체가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존재하지만 언어문자로
51) 위물爲物은 ‘물건 된 모습’, 즉 반야가 작용하는 양상을 말한다. 이 말은 『중용』 제26장에 용례가 있
다. “天地之道, 可一言而盡也. 其爲物不貳[천지의 도는 한마디로 다 할 수가 있다. 그 모습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다].”에 보이는 ‘위물爲物’이 그것이다. 물론 『중용』에서 위물의 의미는 ‘천지의 도가 작용하는 양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52) 혼混은 ‘혼잡하다, 섞이다’는 의미.
53) 유渝는 동사로 ‘변화하다, 달라지다’는 뜻.
54) 접接은 교화하다는 의미, 추麁는 범부·중생을 가리킨다.
55) 지겸이 한역한 『유마경』 권1에 있는 구절이다. T14-p519c.
56) 등각等覺은 반야를 말한다.
57) 성적聖迹은 반야 지혜의 활동을 가리킨다.
58) 만단萬端은 (반야를) 다양하게 해석한다 혹은 반야지혜의 다양한 활동의 흔적을 말한다.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