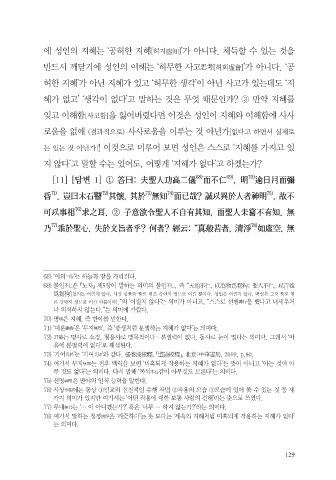Page 131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31
에 성인의 지혜는 ‘공허한 지혜[허지虛知]’가 아니다. 체득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에 성인의 이해는 ‘허무한 사고思考[허회虛會]’가 아니다. ‘공
허한 지혜’가 아닌 지혜가 있고 ‘허무한 생각’이 아닌 사고가 있는데도 ‘지
혜가 없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③ 만약 지혜를
잊고 이해함[사고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성인이 지혜와 이해함에 사사
로움을 없애 (결과적으로) 사사로움을 이루는 것 아닌가[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는 있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성인은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있
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지혜가 없다’고 하겠는가?
70)
68)
69)
[11] [답변 1] ① 答曰: 夫聖人功高二儀 而不仁 , 明 逾日月而彌
74)
71)
72)
73)
75)
昏 . 豈曰木石瞽 其懷, 其於 無知 而已哉? 誠以異於人者神明 , 故不
76)
可以事相 求之耳. ② 子意欲令聖人不自有其知, 而聖人未嘗不有知. 無
77)
78)
乃 乖於聖心, 失於文旨者乎? 何者? 經云: “真般若者, 清淨 如虛空, 無
68) ‘이의二儀’는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
69) 불인不仁은 『노자』 제5장이 말하는 의미의 불인不仁, 즉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
爲芻狗‘[천지는 어질지 않다, 세상 만물을 풀로 엮은 강아지 정도로 여길 뿐이다. 성인은 어질지 않다, 백성을 그저 풀로 엮
은 강아지 정도로 여길 따름이다].”의 ’어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선행善行을 했다고 내세우거
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70) 명明은 지혜, 즉 반야를 말한다.
71) ‘미혼彌昏’은 ‘무지無知’, 즉 ‘중생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는 의미다.
72) 고瞽는 명사로 소경, 형용사로 맹목적이다·분별력이 없다, 동사로 눈이 멀다는 의미다. 그래서 ‘마
음에 분별력이 없다’로 해석된다.
73) ‘기어其於’는 ‘기여其如’와 같다. 張春波校釋, 『肇論校釋』, 北京:中華書局, 2010, p.80.
74) 여기서 무지無知는 전후 맥락을 보면 ‘미혹되게 작용하는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
무 것도 없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목석木石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다.
75) 신명神明은 반야의 인식 능력을 말한다.
76) 사상事相에는 통상 ①밀교의 실천적인 수행 작법 ②작용의 모습 ③모습이 있어 볼 수 있는 것 등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작용에 대한 보통 사람의 견해’라는 뜻으로 쓰였다.
77) 무내無乃는 ‘… 이 아니겠는가?’ 혹은 ‘너무 … 하지 않는가?’라는 의미다.
78) 여기서 말하는 청정淸淨은 ‘깨끗하다’는 뜻 보다는 ‘세속의 지혜처럼 미혹되게 작용하는 지혜가 없다’
는 의미다.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