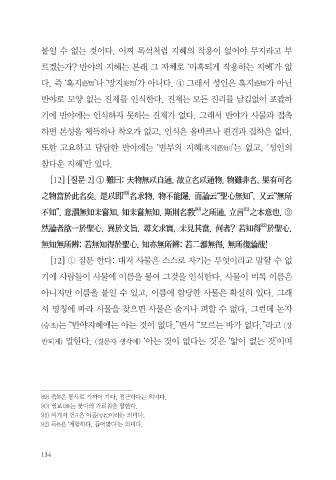Page 136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36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어찌 목석처럼 지혜의 작용이 없어야 무지라고 부
르겠는가? 반야의 지혜는 본래 그 자체로 ‘미혹되게 작용하는 지혜’가 없
다, 즉 ‘혹지惑知’나 ‘망지妄知’가 아니다. ④ 그래서 성인은 혹지惑知가 아닌
반야로 모양 없는 진제를 인식한다. 진제는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포괄하
기에 반야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진제가 없다. 그래서 반야가 사물과 접촉
하면 본성을 체득하나 착오가 없고, 인식은 올바르나 편견과 집착은 없다.
또한 고요하고 담담한 반야에는 ‘범부의 지혜[혹지惑知]’는 없고, ‘성인의
참다운 지혜’만 있다.
[12] [질문 2] ① 難曰: 夫物無以自通, 故立名以通物. 物雖非名, 果有可名
89)
之物當於此名矣. 是以即 名求物, 物不能隱. 而論云“聖心無知”, 又云“無所
91)
90)
不知”. 意謂無知未嘗知, 知未嘗無知. 斯則名教 之所通, 立言 之本意也. ②
92)
然論者欲一於聖心, 異於文旨, 尋文求實, 未見其當. 何者? 若知得 於聖心,
無知無所辨; 若無知得於聖心, 知亦無所辨; 若二都無得, 無所復論哉!
[12] ① 질문 한다: 대저 사물은 스스로 자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
기에 사람들이 사물에 이름을 붙여 그것을 인식한다. 사물이 비록 이름은
아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름에 합당한 사물은 확실히 있다. 그래
서 명칭에 따라 사물을 찾으면 사물은 숨거나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논자
(승조)는 “반야지혜에는 아는 것이 없다.”면서 “모르는 바가 없다.”라고 (상
반되게) 말한다. (질문자 생각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앎이 없는 것’이며
89) 즉即은 동사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는 의미다.
90) 명교名敎는 붓다의 가르침을 말한다.
91) 여기서 언言은 이름[명名]이라는 의미다.
92) 득得은 ‘계합하다, 들어맞다’는 의미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