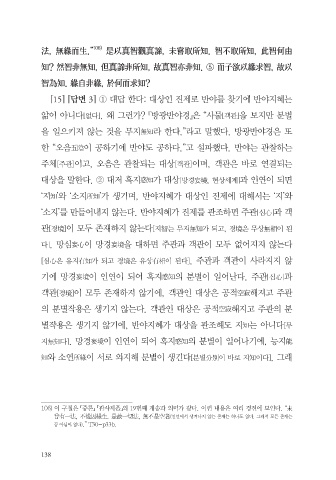Page 140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40
106)
法, 無緣而生.” 是以真智觀真諦, 未嘗取所知. 智不取所知, 此智何由
知? 然智非無知, 但真諦非所知, 故真智亦非知. ⑤ 而子欲以緣求智, 故以
智為知. 緣自非緣, 於何而求知?
[15] [답변 3] ① 대답 한다: 대상인 진제로 반야를 찾기에 반야지혜는
앎이 아니다[없다]. 왜 그런가? 『방광반야경』은 “사물[객관]을 보지만 분별
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무지無知라 한다.”라고 말했다. 방광반야경은 또
한 “오음五陰이 공하기에 반야도 공하다.”고 설파했다. 반야는 관찰하는
주체[주관]이고, 오음은 관찰되는 대상[객관]이며, 객관은 바로 연결되는
대상을 말한다. ② 대저 혹지惑知가 대상[망경妄境. 현상세계]과 인연이 되면
‘지知’와 ‘소지所知’가 생기며, 반야지혜가 대상인 진제에 대해서는 ‘지’와
‘소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반야지혜가 진제를 관조하면 주관[심心]과 객
관[경境]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지智는 무지無知가 되고, 경境은 무상無相이 된
다]. 망심妄心이 망경妄境을 대하면 주관과 객관이 모두 없어지지 않는다
[심心은 유지有知가 되고 경境은 유상有相이 된다].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지 않
기에 망경妄境이 인연이 되어 혹지惑知의 분별이 일어난다. 주관[심心]과
객관[경境]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에, 객관인 대상은 공적空寂해지고 주관
의 분별작용은 생기지 않는다. 객관인 대상은 공적空寂해지고 주관의 분
별작용은 생기지 않기에, 반야지혜가 대상을 관조해도 지知는 아니다[무
지無知다]. 망경妄境이 인연이 되어 혹지惑知의 분별이 일어나기에, 능지能
知와 소연所緣이 서로 의지해 분별이 생긴다[분별分別이 바로 지知이다]. 그래
106) 이 구절은 『중론』 「관사제품」의 19번째 게송과 의미가 같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전에 보인다. “未
曾有一法, 不從因緣生. 是故一切法, 無不是空者(인연에서 생겨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 아님이 없다).” T30-p33b.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