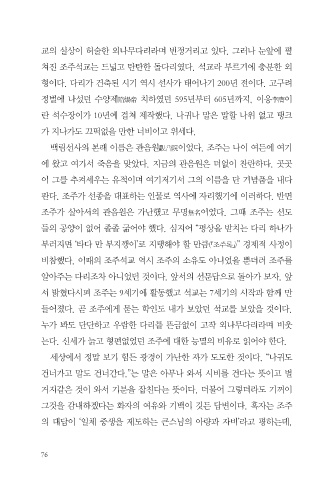Page 78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78
교의 실상이 허술한 외나무다리라며 빈정거리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펼
쳐진 조주석교는 드넓고 탄탄한 돌다리였다. 석교라 부르기에 충분한 외
형이다. 다리가 건축된 시기 역시 선사가 태어나기 200년 전이다.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수양제隋煬帝 치하였던 595년부터 605년까지, 이응李膺이
란 석수장이가 10년에 걸쳐 제작했다. 나귀나 말은 말할 나위 없고 탱크
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한 너비이고 위세다.
백림선사의 본래 이름은 관음원觀音院이었다. 조주는 나이 여든에 여기
에 왔고 여기서 죽음을 맞았다. 지금의 관음원은 더없이 찬란하다. 곳곳
이 그를 추켜세우는 유적이며 여기저기서 그의 이름을 단 기념품을 내다
판다. 조주가 선종을 대표하는 인물로 역사에 자리했기에 이러하다. 반면
조주가 살아서의 관음원은 가난했고 무명無名이었다. 그때 조주는 신도
들의 공양이 없어 졸졸 굶어야 했다. 심지어 “평상을 받치는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타다 만 부지깽이’로 지탱해야 할 만큼(『조주록』)” 경제적 사정이
비참했다. 이때의 조주석교 역시 조주의 소유도 아니었을 뿐더러 조주를
알아주는 다리조차 아니었던 것이다. 앞서의 선문답으로 돌아가 보자. 앞
서 밝혔다시피 조주는 9세기에 활동했고 석교는 7세기의 시작과 함께 만
들어졌다. 곧 조주에게 묻는 학인도 내가 보았던 석교를 보았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단단하고 우람한 다리를 뜬금없이 고작 외나무다리라며 비웃
는다. 신세가 늙고 형편없었던 조주에 대한 능멸의 비유로 읽어야 한다.
세상에서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 가난한 자가 도도한 것이다. “나귀도
건너가고 말도 건너간다.”는 말은 아무나 와서 시비를 건다는 뜻이고 별
거지같은 것이 와서 기분을 잡친다는 뜻이다. 더불어 그렇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여유와 기백이 깃든 답변이다. 혹자는 조주
의 대답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큰스님의 아량과 자비’라고 평하는데,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