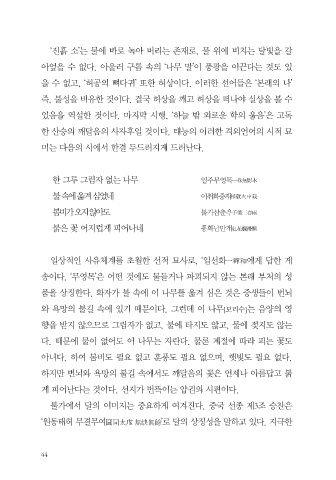Page 46 - 고경 - 2019년 8월호 Vol. 76
P. 46
‘진흙 소’는 물에 바로 녹아 버리는 존재로, 물 위에 비치는 달빛을 갈
아엎을 수 없다. 아울러 구름 속의 ‘나무 말’이 풍광을 이끈다는 것도 있
을 수 없고, ‘허공의 뼈다귀’ 또한 허상이다. 이러한 선어들은 ‘본래의 나’
즉,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결국 허상을 깨고 허상을 떠나야 실상을 볼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마지막 시행, ‘하늘 밖 외로운 학의 울음’은 고독
한 산승의 깨달음의 사자후일 것이다. 태능의 이러한 격외언어의 시적 묘
미는 다음의 시에서 한결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 일주무영목一株無影木
불 속에 옮겨 심었네 이취화중재 移就火中栽
봄비가 오지 않아도 불가삼춘우不假三春雨
붉은 꽃 어지럽게 피어나네 홍화난만개紅花爛漫開
일상적인 사유체계를 초월한 선적 묘사로, ‘일선화一禪和에게 답한 게
송이다. ‘무영목’은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파괴되지 않는 본래 부처의 성
품을 상징한다. 화자가 불 속에 이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은 중생들이 번뇌
와 욕망의 불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무[보리수]는 음양의 영
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림자가 없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는
다. 때문에 물이 없어도 이 나무는 자란다. 물론 계절에 따라 피는 꽃도
아니다. 하여 봄비도 필요 없고 훈풍도 필요 없으며, 햇빛도 필요 없다.
하지만 번뇌와 욕망의 불길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은 언제나 아름답고 붉
게 피어난다는 것이다. 선지가 번뜩이는 압권의 시편이다.
불가에서 달의 이미지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국 선종 제3조 승찬은
‘원동태허 무결무여圓同太虛 無缺無餘’로 달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다. 지극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