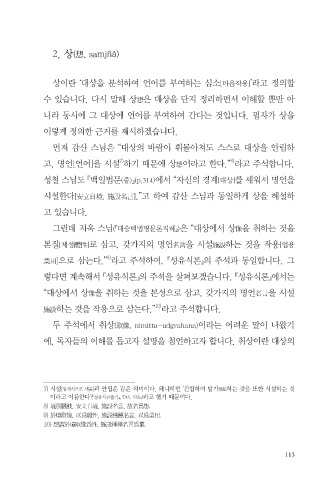Page 115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115
2. 상(想, saṃjñā)
상이란 ‘대상을 분석하여 언어를 부여하는 심소[마음작용]’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想은 대상을 단지 정리하면서 이해할 뿐만 아
니라 동시에 그 대상에 언어를 부여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상을
이렇게 정의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산 스님은 “대상의 바람이 휘몰아쳐도 스스로 대상을 안립하
7)
8)
고, 명언[언어]을 시설 하기 때문에 상想이라고 한다.” 라고 주석합니다.
성철 스님도 『백일법문(중)』(p.314)에서 “자신의 경계[대상]를 세워서 명언을
시설한다[安立自境. 施設名言].”고 하여 감산 스님과 동일하게 상을 해설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욱 스님(『대승백법명문론직해』)은 “대상에서 상像을 취하는 것을
본질[체성體性]로 삼고, 갖가지의 명언名言을 시설施設하는 것을 작용[업용
9)
業用]으로 삼는다.” 라고 주석하여, 『성유식론』의 주석과 동일합니다. 그
렇다면 계속해서 『성유식론』의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유식론』에서는
“대상에서 상像을 취하는 것을 본성으로 삼고, 갖가지의 명언名言을 시설
10)
施設하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라고 주석합니다.
두 주석에서 취상(取像, nimitta-udgrahana)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기
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취상이란 대상의
7) 시설[임시적으로 세움]과 안립은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건립하여 발기發起하는 것을 또한 시설하는 것
이라고 이름한다’(『성유식론술기』, T43, 332a)라고 했기 때문이다.
8) 境風飄鼓. 安立自境. 施設名言. 故名爲想.
9) 於境取像. 以爲體性. 施設種種名言. 以爲業用.
10) 想謂於境取像爲性. 施設種種名言爲業.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