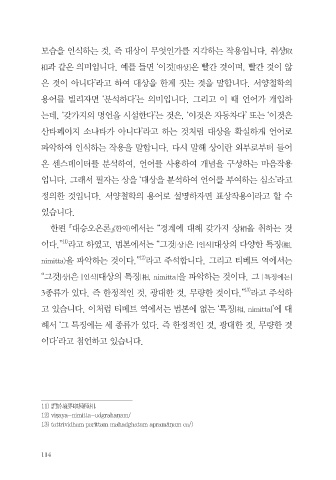Page 116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116
모습을 인식하는 것, 즉 대상이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작용입니다. 취상取
相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대상]은 빨간 것이며, 빨간 것이 않
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대상을 한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서양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분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때 언어가 개입하
는데, ‘갖가지의 명언을 시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동차다’ 또는 ‘이것은
산타페이지 소나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상을 확실하게 언어로
파악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이란 외부로부터 들어
온 센스데이터를 분석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구성하는 마음작용
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상을 ‘대상을 분석하여 언어를 부여하는 심소’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서양철학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표상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승오온론』(한역)에서는 “경계에 대해 갖가지 상相을 취하는 것
11)
이다.” 라고 하였고, 범본에서는 “그것[상]은 [인식]대상의 다양한 특징(相,
12)
nimitta)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역에서는
“그것[상]은 [인식]대상의 특징[相, nimitta]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특징에는]
13)
3종류가 있다. 즉 한정적인 것, 광대한 것, 무량한 것이다.” 라고 주석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티베트 역에서는 범본에 없는 ‘특징[相, nimitta]’에 대
해서 ‘그 특징에는 세 종류가 있다. 즉 한정적인 것, 광대한 것, 무량한 것
이다’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11) 謂於境界取種種相.
12) viṣaya-nimitta-udgrahaṇam/
13) tattrividham parīttam mahadghatam apramāṇam ca/)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