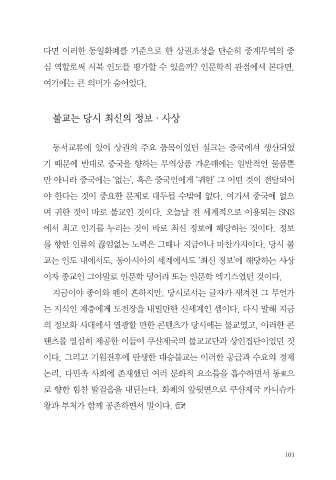Page 103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03
다면 이러한 동일화폐를 기준으로 한 상권조성을 단순히 중계무역의 중
심 역할로써 서북 인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큰 의미가 숨어있다.
불교는 당시 최신의 정보·사상
동서교류에 있어 상권의 주요 품목이었던 실크는 중국에서 생산되었
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을 향하는 무역상품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물품뿐
만 아니라 중국에는 ‘없는’, 혹은 중국인에게 ‘귀한’ 그 어떤 것이 전달되어
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국에 없으
며 귀한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
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최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보
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시 불
교는 인도 내에서도, 동아시아의 세계에서도 ‘최신 정보’에 해당하는 사상
이자 종교인 그야말로 인문학 덩어리 또는 인문학 엑기스였던 것이다.
지금이야 종이와 펜이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글자가 새겨진 그 무언가
는 지식인 계층에게 도전장을 내밀만한 신세계인 셈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의 정보화 시대에서 열광할 만한 콘텐츠가 당시에는 불교였고, 이러한 콘
텐츠를 열심히 제공한 이들이 쿠샨제국의 불교교단과 상인집단이었던 것
이다. 그리고 기원전후에 탄생한 대승불교는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경제
논리, 다민족 사회에 존재했던 여러 문화적 요소들을 흡수하면서 동東으
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화폐의 앞뒷면으로 쿠샨제국 카니슈카
왕과 부처가 함께 공존하면서 말이다.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