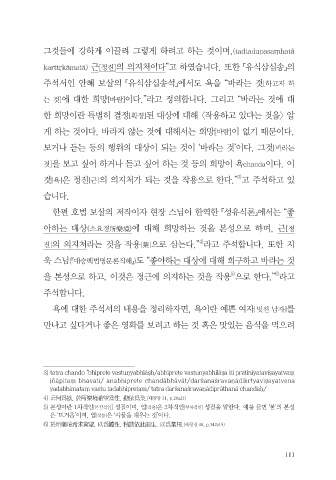Page 113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13
그것들에 강하게 이끌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tadtadupasaṃhatā
karttŗkāmatā) 근[정진]의 의지처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식삼십송』의
주석서인 안혜 보살의 『유식삼십송석』에서도 욕을 “바라는 것[하고자 하
는 것]에 대한 희망[바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
한 희망이란 특별히 결정[확정]된 대상에 대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게 하는 것이다.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보거나 듣는 등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라는 것’이다. 그것[바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 것 등의 희망이 욕chanda이다. 이
3)
것[욕]은 정진[근]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작용으로 한다.” 고 주석하고 있
습니다.
한편 호법 보살의 저작이자 현장 스님이 한역한 『성유식론』에서는 “좋
아하는 대상(소요경所樂境)에 대해 희망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며, 근[정
4)
진]의 의지처라는 것을 작용[業]으로 삼는다.” 라고 주석합니다. 또한 지
욱 스님(『대승백법명문론직해』)도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희구하고 바라는 것
5)
6)
을 본성으로 하고, 이것은 정근에 의지하는 것을 작용 으로 한다.” 라고
주석합니다.
욕에 대한 주석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욕이란 예쁜 여자[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다거나 좋은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3) tatra chando 'bhiprete vastuṇyabhiāṣḥ/abhiprete vastunyabhilāṣa iti pratiniyataviṣayatvaṃ
jñāpitaṃ bhavati/ anabhiprete chandābhāvāt/darśanaśravaṇādikrtyaviṣayatvena
yadabhimataṃ vastu tadabhipretam/ tatra darśanaśravaṇādiprāthanā chandaḥ/
4) 云何爲欲. 於所樂境希望爲性. 勤依爲業.(대정장 31, p.28a21)
5) 본성이란 1차적인[본질적인] 성질이며, 업[작용]은 2차적인[부차적인]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의 본성
은 ‘뜨거움’이며, 업[작용]은 ‘사물을 태우는 것’이다.
6) 於所樂境希求冀望. 以爲體性. 精勤依此而生. 以爲業用.(속장경 48, p.342c15)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