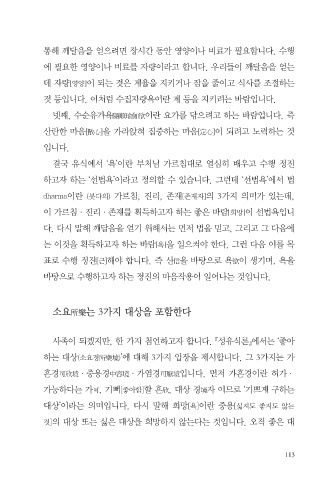Page 115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15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면 장시간 동안 영양이나 비료가 필요합니다. 수행
에 필요한 영양이나 비료를 자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자량[영양]이 되는 것은 계율을 지키거나 잠을 줄이고 식사를 조절하는
것 등입니다. 이처럼 수집자량욕이란 계 등을 지키려는 바람입니다.
넷째, 수순유가욕隨順瑜伽欲이란 요가를 닦으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즉
산란한 마음[散心]을 가라앉혀 집중하는 마음[定心]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입니다.
결국 유식에서 ‘욕’이란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배우고 수행 정진
하고자 하는 ‘선법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법욕’에서 법
dharma이란 (붓다의) 가르침, 진리, 존재[존재자]의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가르침·진리·존재를 획득하고자 하는 좋은 바람[희망]이 선법욕입니
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는 이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바람[욕]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목
표로 수행 정진[근]해야 합니다. 즉 신信을 바탕으로 욕欲이 생기며, 욕을
바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정진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요所樂는 3가지 대상을 포함한다
사족이 되겠지만,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성유식론』에서는 ‘좋아
하는 대상(소요경所樂境)’에 대해 3가지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 3가지는 가
흔경可欣境·중용경中容境·가염경可厭境입니다. 먼저 가흔경이란 허가·
가능하다는 가可, 기뻐[좋아함]할 흔欣, 대상 경境자 이므로 ‘기쁘게 구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욕]이란 중용[싫지도 좋지도 않는
것]의 대상 또는 싫은 대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