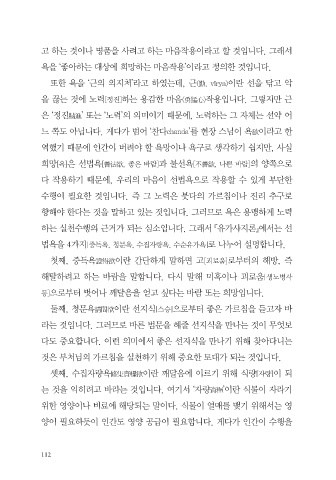Page 114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14
고 하는 것이나 명품을 사려고 하는 마음작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좋아하는 대상에 희망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욕을 ‘근의 의지처’라고 하였는데, 근(勤, vīrya)이란 선을 닦고 악
을 끊는 것에 노력[정진]하는 용감한 마음(勇猛心)작용입니다. 그렇지만 근
은 ‘정진精進’ 또는 ‘노력’의 의미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 자체는 선악 어
느 쪽도 아닙니다. 게다가 범어 ‘찬다chanda’를 현장 스님이 욕欲이라고 한
역했기 때문에 인간이 버려야 할 욕망이나 욕구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희망[욕]은 선법욕[善法欲, 좋은 바람]과 불선욕[不善欲, 나쁜 바람]의 양쪽으로
다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선법욕으로 작용할 수 있게 부단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 노력은 붓다의 가르침이나 진리 추구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은 용맹하게 노력
하는 실천수행의 근거가 되는 심소입니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선
법욕을 4가지[증득욕, 청문욕, 수집자량욕, 수순유가욕]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증득욕證得欲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고[괴로움]로부터의 해방, 즉
해탈하려고 하는 바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미혹이나 괴로움[생노병사
등]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바람 또는 희망입니다.
둘째, 청문욕請問欲이란 선지식[스승]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듣고자 바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법문을 해줄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수집자량욕修集資糧欲이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식량[자량]이 되
는 것을 익히려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량資糧’이란 식물이 자라기
위한 영양이나 비료에 해당되는 말이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
양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인간이 수행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