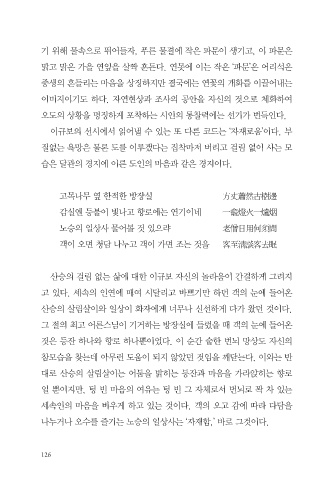Page 128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28
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자, 푸른 물결에 작은 파문이 생기고, 이 파문은
맑고 맑은 가을 연잎을 살짝 흔든다. 연못에 이는 작은 ‘파문’은 어리석은
중생의 흔들리는 마음을 상징하지만 결국에는 연꽃의 개화를 이끌어내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자연현상과 조사의 공안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여
오도의 상황을 명징하게 포착하는 시인의 통찰력에는 선기가 번득인다.
이규보의 선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코드는 ‘자재로움’이다. 부
질없는 욕망은 물론 도를 이루겠다는 집착마저 버리고 걸림 없이 사는 모
습은 달관의 경지에 이른 도인의 마음과 같은 경지이다.
고목나무 옆 한적한 방장실 方丈蕭然古樹邊
감실엔 등불이 빛나고 향로에는 연기이네 一龕燈火一爐烟
노승의 일상사 물어볼 것 있으랴 老僧日用何須問
객이 오면 청담 나누고 객이 가면 조는 것을 客至淸談客去眠
산승의 걸림 없는 삶에 대한 이규보 자신의 놀라움이 간결하게 그려지
고 있다. 세속의 인연에 매여 시달리고 바쁘기만 하던 객의 눈에 들어온
산승의 살림살이와 일상이 화자에게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 왔던 것이다.
그 절의 최고 어른스님이 기거하는 방장실에 들렀을 때 객의 눈에 들어온
것은 등잔 하나와 향로 하나뿐이었다. 이 순간 숱한 번뇌 망상도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는다. 이와는 반
대로 산승의 살림살이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향로
일 뿐이지만, 텅 빈 마음의 여유는 텅 빈 그 자체로서 번뇌로 꽉 차 있는
세속인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객의 오고 감에 따라 다담을
나누거나 오수를 즐기는 노승의 일상사는 ‘자재함,’ 바로 그것이다.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