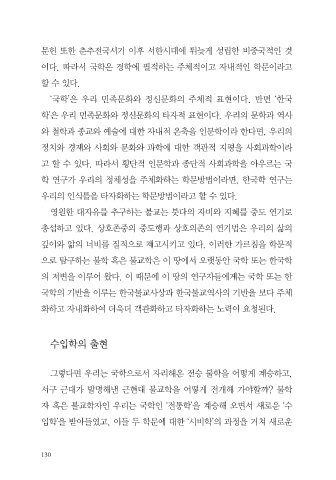Page 132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32
문헌 또한 춘추전국시기 이후 서한시대에 뒤늦게 성립한 비중국적인 것
이다. 따라서 국학은 경학에 필적하는 주체적이고 자내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학’은 우리 민족문화와 정신문화의 주체적 표현이다. 반면 ‘한국
학’은 우리 민족문화와 정신문화의 타자적 표현이다. 우리의 문학과 역사
와 철학과 종교와 예술에 대한 자내적 온축을 인문학이라 한다면,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에 대한 객관적 지평을 사회과학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적 인문학과 종단적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국
학 연구가 우리의 정체성을 주체화하는 학문방법이라면, 한국학 연구는
우리의 인식틀을 타자화하는 학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대자유를 추구하는 불교는 붓다의 자비와 지혜를 중도 연기로
총섭하고 있다. 상호존중의 중도행과 상호의존의 연기법은 우리의 삶의
깊이와 앎의 너비를 질적으로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학문적
으로 탐구하는 불학 혹은 불교학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국학 또는 한국학
의 저변을 이루어 왔다. 이 때문에 이 땅의 연구자들에게는 국학 또는 한
국학의 기반을 이루는 한국불교사상과 한국불교역사의 기반을 보다 주체
화하고 자내화하여 더욱더 객관화하고 타자화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수입학의 출현
그렇다면 우리는 국학으로서 자리해온 전승 불학을 어떻게 계승하고,
서구 근대가 발명해낸 근현대 불교학을 어떻게 전개해 가야할까? 불학
자 혹은 불교학자인 우리는 국학인 ‘전통학’을 계승해 오면서 새로운 ‘수
입학’을 받아들였고, 이들 두 학문에 대한 ‘시비학’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