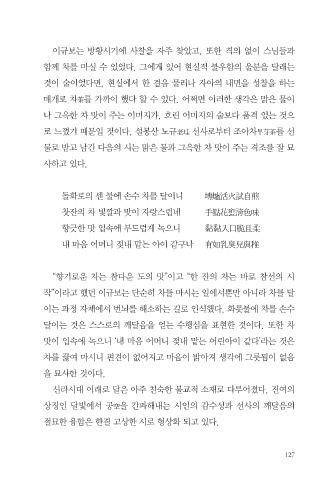Page 129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29
이규보는 방황시기에 사찰을 자주 찾았고, 또한 격의 없이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현실적 불우함의 울분을 달래는
것이 술이었다면,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아의 내면을 성찰을 하는
매개로 차茶를 가까이 했다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맑은 물이
나 그윽한 차 맛이 주는 이미지가, 흐린 이미지의 술보다 품격 있는 것으
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설봉산 노규老珪 선사로부터 조아차早芽茶를 선
물로 받고 남긴 다음의 시는 맑은 물과 그윽한 차 맛이 주는 격조를 잘 묘
사하고 있다.
돌화로의 센 불에 손수 차를 달이니 塼爐活火試自煎
찻잔의 차 빛깔과 맛이 자랑스럽네 手點花甕誇色味
향긋한 맛 입속에 부드럽게 녹으니 黏黏入口脆且柔
내 마음 어머니 젖내 맡는 아이 같구나 有如乳臭兒與稚
“향기로운 차는 참다운 도의 맛”이고 “한 잔의 차는 바로 참선의 시
작”이라고 했던 이규보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차를 달
이는 과정 자체에서 번뇌를 해소하는 길로 인식했다. 화롯불에 차를 손수
달이는 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차
맛이 입속에 녹으니 ‘내 마음 어머니 젖내 맡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차를 끓여 마시니 편견이 없어지고 마음이 밝아져 생각에 그릇됨이 없음
을 묘사한 것이다.
신라시대 이래로 달은 아주 친숙한 불교적 소재로 다루어졌다. 진여의
상징인 달빛에서 공空을 간파해내는 시인의 감수성과 선사의 깨달음의
절묘한 융합은 한결 고상한 시로 형상화 되고 있다.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