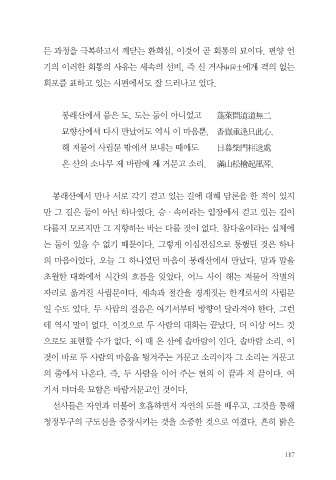Page 119 - 고경 - 2020년 3월호 Vol. 83
P. 119
든 과정을 극복하고서 깨닫는 환희심, 이것이 곧 회통의 묘이다. 편양 언
기의 이러한 회통의 사유는 세속의 선비, 즉 신 거사申居士에게 격의 없는
회포를 표하고 있는 시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봉래산에서 물은 도, 도는 둘이 아니었고 蓬萊問道道無二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어도 역시 이 마음뿐. 香嶽重逢只此心.
해 저물어 사립문 밖에서 보내는 때에도 日暮柴門相送處
온 산의 소나무 제 바람에 제 거문고 소리. 滿山松檜起風琴.
봉래산에서 만나 서로 각기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담론을 한 적이 있지
만 그 길은 둘이 아닌 하나였다. 승·속이라는 입장에서 걷고 있는 길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다를 것이 없다. 참다움이라는 실체에
는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은 하나
의 마음이었다. 오늘 그 하나였던 마음이 봉래산에서 만났다. 말과 말을
초월한 대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어느 사이 해는 저물어 작별의
자리로 옮겨진 사립문이다. 세속과 절간을 경계짓는 한계로서의 사립문
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여기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데 역시 말이 없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다. 더 이상 어느 것
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때 온 산에 솔바람이 인다. 솔바람 소리, 이
것이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을 튕겨주는 거문고 소리이자 그 소리는 거문고
의 줄에서 나온다. 즉, 두 사람을 이어 주는 현의 이 끝과 저 끝이다. 여
기서 더더욱 묘함은 바람거문고인 것이다.
선사들은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자연의 도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청정무구의 구도심을 증장시키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흔히 밝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