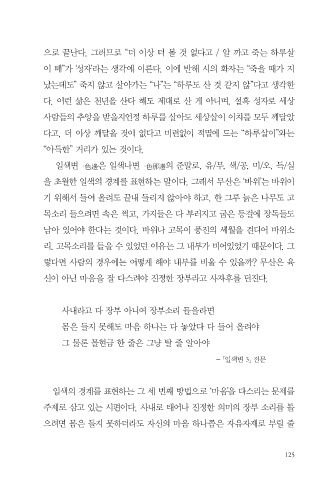Page 127 - 고경 - 2020년 9월호 Vol. 89
P. 127
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 알 까고 죽는 하루살
이 떼”가 ‘성자’라는 생각에 이른다. 이에 반해 시의 화자는 “죽을 때가 지
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나”는 “하루도 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다. 이런 삶은 천년을 산다 해도 제대로 산 게 아니며, 설혹 성자로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지언정 하루를 살아도 세상살이 이치를 모두 깨달았
다고,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고 미련없이 적멸에 드는 “하루살이”와는
“아득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일색변一色邊은 일색나변一色那邊의 준말로, 유/무, 색/공, 미/오, 득/실
을 초월한 일색의 경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무산은 ‘바위’는 바위이
기 위해서 들어 올려도 끝내 들리지 않아야 하고,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
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썩고, 가지들은 다 부러지고 굽은 등걸에 장독들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위나 고목이 풍진의 세월을 견디어 바위소
리, 고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내부가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내부를 비울 수 있을까? 무산은 육
신이 아닌 마음을 잘 다스려야 진정한 장부라고 사자후를 던진다.
사내라고 다 장부 아니여 장부소리 들을라면
몸은 들지 못해도 마음 하나는 다 놓았다 다 들어 올려야
그 물론 몰현금 한 줄은 그냥 탈 줄 알아야
- 「일색변 3」 전문
일색의 경계를 표현하는 그 세 번째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시편이다. 사내로 태어나 진정한 의미의 장부 소리를 들
으려면 몸은 들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하나쯤은 자유자재로 부릴 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