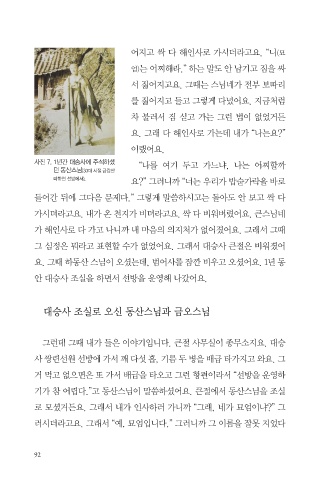Page 94 - 고경 - 2024년 2월호 Vol. 130
P. 94
어지고 싹 다 해인사로 가시더라고요. “니(묘
엄)는 어찌해라.” 하는 말도 안 남기고 짐을 싸
서 짊어지고요. 그때는 스님네가 전부 보따리
를 짊어지고 들고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처럼
차 불러서 짐 싣고 가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
요. 그래 다 해인사로 가는데 내가 “나는요?”
이랬어요.
사진 7. 1년간 대승사에 주석하셨
“나를 여기 두고 가느냐, 나는 어찌할까
던 동산스님(30대 시절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밥숟가락을 바로
들어간 뒤에 그다음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도 안 보고 싹 다
가시더라고요. 내가 온 천지가 비더라고요. 싹 다 비워버렸어요. 큰스님네
가 해인사로 다 가고 나니까 내 마음의 의지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승사 큰절은 비워졌어
요. 그때 하동산 스님이 오셨는데, 범어사를 잠깐 비우고 오셨어요. 1년 동
안 대승사 조실을 하면서 선방을 운영해 나갔어요.
대승사 조실로 오신 동산스님과 금오스님
그런데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절 사무실이 종무소지요. 대승
사 쌍련선원 선방에 가서 깨 다섯 홉, 기름 두 병을 배급 타가지고 와요. 그
거 먹고 없으면은 또 가서 배급을 타오고 그런 형편이라서 “선방을 운영하
기가 참 어렵다.”고 동산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큰절에서 동산스님을 조실
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가니까 “그래, 네가 묘엄이냐?” 그
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묘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잘못 지었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