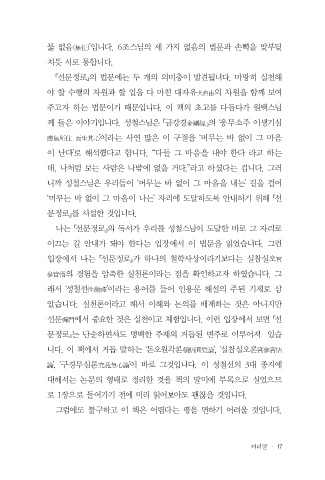Page 17 - 정독 선문정로
P. 17
묾 없음(無住)’입니다. 6조스님의 세 가지 없음의 법문과 손뼉을 맞부딪
치듯 서로 통합니다.
『선문정로』의 법문에는 두 개의 의미층이 발견됩니다. 마땅히 실천해
야 할 수행의 차원과 할 일을 다 마친 대자유大自由의 차원을 함께 보여
주고자 하는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초고를 다듬다가 원택스님
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철스님은 『금강경金剛經』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사연 많은 이 구절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이 난다’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데, 나처럼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
니까 성철스님은 우리들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길을 걸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나는’ 자리에 도달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선
문정로』를 시설한 것입니다.
나는 『선문정로』의 독서가 우리를 성철스님이 도달한 바로 그 자리로
이끄는 길 안내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법문을 읽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는 『선문정로』가 하나의 철학사상이라기보다는 실참실오實
參實悟의 경험을 압축한 실천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래서 ‘성철선性徹禪’이라는 용어를 들어 인용문 해설의 주된 기제로 삼
았습니다. 실천론이라고 해서 이해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문禪門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체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선
문정로』는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주제의 거듭된 변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이 책에서 거듭 말하는 ‘돈오원각론頓悟圓覺論’, ‘실참실오론實參實悟
論’, ‘구경무심론究竟無心論’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철선의 3대 종지에
대해서는 논문의 형태로 정리한 것을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으므
로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읽어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렵다는 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머리말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