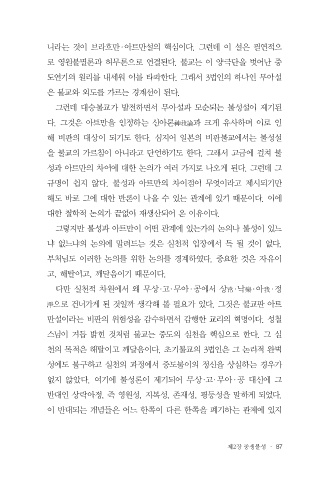Page 87 - 정독 선문정로
P. 87
니라는 것이 브라흐만·아트만설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설은 필연적으
로 영원불멸론과 허무론으로 연결된다. 불교는 이 양극단을 벗어난 중
도연기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타파한다. 그래서 3법인의 하나인 무아설
은 불교와 외도를 가르는 경계선이 된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무아설과 모순되는 불성설이 제기된
다. 그것은 아트만을 인정하는 신아론神我論과 크게 유사하며 이로 인
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본의 비판불교에서는 불성설
을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금에 걸쳐 불
성과 아트만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
규명이 쉽지 않다. 불성과 아트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제시되기만
해도 바로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끝없이 재생산되어 온 이유이다.
그렇지만 불성과 아트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의 논의나 불성이 있느
냐 없느냐의 논의에 말려드는 것은 실천적 입장에서 득 될 것이 없다.
부처님도 이러한 논의를 위한 논의를 경계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유이
고, 해탈이고,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천적 차원에서 왜 무상·고·무아·공에서 상常·낙樂·아我·정
淨으로 건너가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불교판 아트
만설이라는 비판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감행한 교리의 혁명이다. 성철
스님이 거듭 밝힌 것처럼 불교는 중도의 실천을 핵심으로 한다. 그 실
천의 목적은 해탈이고 깨달음이다. 초기불교의 3법인은 그 논리적 완벽
성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과정에서 중도불이의 정신을 상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여기에 불성론이 제기되어 무상·고·무아·공 대신에 그
반대인 상락아정, 즉 영원성, 지복성, 존재성, 평등성을 말하게 되었다.
이 반대되는 개념들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폐기하는 관계에 있지
제2장 중생불성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