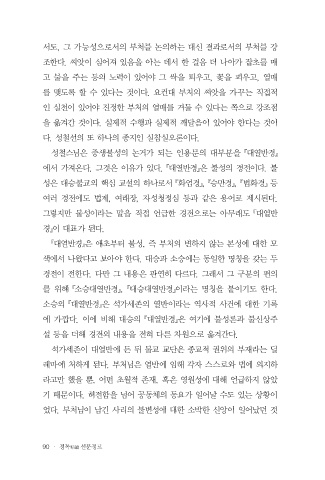Page 90 - 정독 선문정로
P. 90
서도, 그 가능성으로서의 부처를 논의하는 대신 결과로서의 부처를 강
조한다.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잡초를 매
고 물을 주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를 맺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처의 씨앗을 가꾸는 직접적
인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부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쪽으로 강조점
을 옮겨간 것이다. 실제적 수행과 실제적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성철선의 또 하나의 종지인 실참실오론이다.
성철스님은 중생불성의 논거가 되는 인용문의 대부분을 『대열반경』
에서 가져온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 『대열반경』은 불성의 경전이다. 불
성은 대승불교의 핵심 교설의 하나로서 『화엄경』, 『승만경』, 『법화경』 등
여러 경전에도 법계, 여래장, 자성청정심 등과 같은 용어로 제시된다.
그렇지만 불성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한 경전으로는 아무래도 『대열반
경』이 대표가 된다.
『대열반경』은 애초부터 불성, 즉 부처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 대한 모
색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대승과 소승에는 동일한 명칭을 갖는 두
경전이 전한다. 다만 그 내용은 판연히 다르다. 그래서 그 구분의 편의
를 위해 『소승대열반경』, 『대승대열반경』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소승의 『대열반경』은 석가세존의 열반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에 가깝다. 이에 비해 대승의 『대열반경』은 여기에 불성론과 불신상주
설 등을 더해 경전의 내용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
석가세존이 대열반에 든 뒤 불교 교단은 종교적 권위의 부재라는 딜
레마에 처하게 된다. 부처님은 열반에 임해 각자 스스로와 법에 의지하
라고만 했을 뿐, 어떤 초월적 존재, 혹은 영원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허전함을 넘어 공동체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었다. 부처님이 남긴 사리의 불변성에 대한 소박한 신앙이 일어났던 것
90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