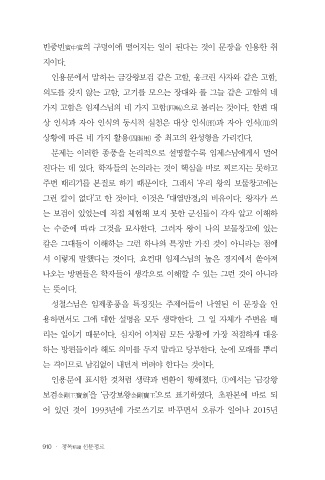Page 910 - 정독 선문정로
P. 910
빈중빈賓中賓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 문장을 인용한 취
지이다.
인용문에서 말하는 금강왕보검 같은 고함, 웅크린 사자와 같은 고함,
의도를 갖지 않는 고함, 고기를 모으는 장대와 풀 그늘 같은 고함의 네
가지 고함은 임제스님의 네 가지 고함(四喝)으로 불리는 것이다. 한편 대
상 인식과 자아 인식의 동시적 실천은 대상 인식(照)과 자아 인식(用)의
상황에 따른 네 가지 활용(四照用) 중 최고의 완성형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러한 종풍을 논리적으로 설명할수록 임제스님에게서 멀어
진다는 데 있다. 학자들의 논의라는 것이 핵심을 바로 찌르지는 못하고
주변 때리기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왕의 보물창고에는
그런 칼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대열반경』의 비유이다. 왕자가 쓰
는 보검이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군신들이 각자 알고 이해하
는 수준에 따라 그것을 묘사한다. 그러자 왕이 나의 보물창고에 있는
칼은 그대들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특징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임제스님의 높은 경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편들은 학자들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는 뜻이다.
성철스님은 임제종풍을 특징짓는 주제어들이 나열된 이 문장을 인
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설명을 모두 생략한다. 그 일 자체가 주변을 때
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처럼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
하는 방편들이라 해도 의미를 두지 말라고 당부한다. 눈에 모래를 뿌리
는 격이므로 남김없이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용문에 표시한 것처럼 생략과 변환이 행해졌다. ①에서는 ‘금강왕
보검金剛王寶劍’을 ‘금강보왕金剛寶王’으로 표기하였다. 초판본에 바로 되
어 있던 것이 1993년에 가로쓰기로 바꾸면서 오류가 일어나 2015년
910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