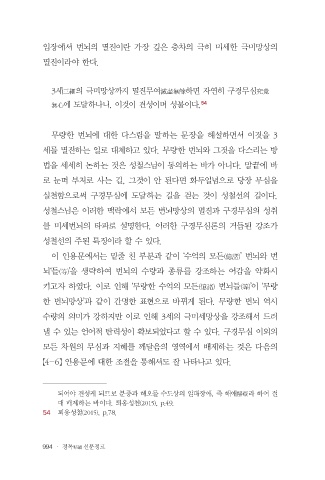Page 994 - 정독 선문정로
P. 994
입장에서 번뇌의 멸진이란 가장 깊은 층차의 극히 미세한 극미망상의
멸진이라야 한다.
3세三細의 극미망상까지 멸진무여滅盡無餘하면 자연히 구경무심究竟
無心에 도달하나니, 이것이 견성이며 성불이다. 54
무량한 번뇌에 대한 다스림을 말하는 문장을 해설하면서 이것을 3
세를 멸진하는 일로 대체하고 있다. 무량한 번뇌와 그것을 다스리는 방
법을 세세히 논하는 것은 성철스님이 동의하는 바가 아니다. 말끝에 바
로 눈떠 부처로 사는 길, 그것이 안 된다면 화두일념으로 당장 무심을
실천함으로써 구경무심에 도달하는 길을 걷는 것이 성철선의 길이다.
성철스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번뇌망상의 멸진과 구경무심의 성취
를 미세번뇌의 타파로 설명한다. 이러한 구경무심론의 거듭된 강조가
성철선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억의 모든(億諸)’ 번뇌와 번
뇌‘들(等)’을 생략하여 번뇌의 수량과 종류를 강조하는 어감을 약화시
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무량한 수억의 모든(億諸) 번뇌들(等)’이 ‘무량
한 번뇌망상’과 같이 간명한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무량한 번뇌 역시
수량의 의미가 강하지만 이로 인해 3세의 극미세망상을 강조해서 드러
낼 수 있는 언어적 탄력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경무심 이외의
모든 차원의 무심과 지혜를 깨달음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음의
【4-6】 인용문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되어야 견성케 되므로 분증과 해오를 수도상의 일대장애, 즉 해애解礙라 하여 절
대 배제하는 바이다. 퇴옹성철(2015), p.49.
54 퇴옹성철(2015), p.78.
994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