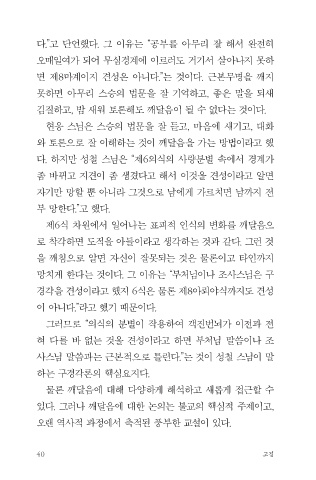Page 42 - 고경 - 2016년 1월호 Vol. 33
P. 42
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공부를 아무리 잘 해서 완전히
오매일여가 되어 무심경계에 이르러도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
면 제8마계이지 견성은 아니다.”는 것이다. 근본무명을 깨지
못하면 아무리 스승의 법문을 잘 기억하고, 좋은 말을 되새
김질하고, 밤 새워 토론해도 깨달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스승의 법문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대화
와 토론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을 가는 방법이라고 했
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제6의식의 사량분별 속에서 경계가
좀 바뀌고 지견이 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견성이라고 알면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남에게 가르치면 남까지 전
부 망한다.”고 했다.
제6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표피적 인식의 변화를 깨달음으
로 착각하면 도적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
을 깨침으로 알면 자신이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망치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은 구
경각을 견성이라고 했지 6식은 물론 제8아뢰야식까지도 견성
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분별이 작용하여 객진번뇌가 이전과 전
혀 다를 바 없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이나 조
사스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틀린다.”는 것이 성철 스님이 말
하는 구경각론의 핵심요지다.
물론 깨달음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논의는 불교의 핵심적 주제이고,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교설이 있다.
40 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