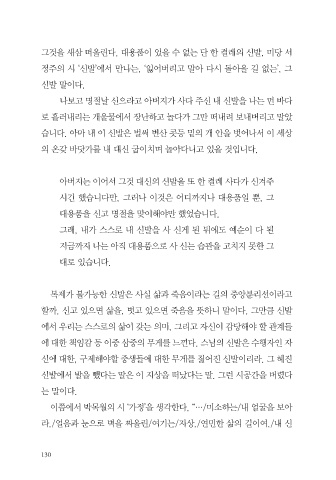Page 132 - 고경 - 2018년 9월호 Vol. 65
P. 132
그것을 새삼 떠올린다. 대용품이 있을 수 없는 단 한 켤레의 신발, 미당 서
정주의 시 ‘신발’에서 만나는, ‘잃어버리고 말아 다시 돌아올 길 없는’, 그
신발 말이다.
나보고 명절날 신으라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내 신발을 나는 먼 바다
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그만 떠내려 보내버리고 말았
습니다. 아마 내 이 신발은 벌써 변산 콧등 밑의 개 안을 벗어나서 이 세상
의 온갖 바닷가를 내 대신 굽이치며 놀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그것 대신의 신발을 또 한 켤레 사다가 신겨주
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용품일 뿐, 그
대용품을 신고 명절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내 신발을 사 신게 된 뒤에도 예순이 다 된
지금까지 나는 아직 대용품으로 사 신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그
대로 있습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신발은 사실 삶과 죽음이라는 길의 중앙분리선이라고
할까. 신고 있으면 삶을, 벗고 있으면 죽음을 뜻하니 말이다. 그만큼 신발
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이 갖는 의미,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관계들
에 대한 책임감 등 이중 삼중의 무게를 느낀다. 스님의 신발은 수행자인 자
신에 대한, 구제해야할 중생들에 대한 무게를 짊어진 신발이리라. 그 헤진
신발에서 발을 뺐다는 말은 이 지상을 떠났다는 말. 그런 시공간을 버렸다
는 말이다.
이쯤에서 박목월의 시 ‘가정’을 생각한다. “…/미소하는/내 얼굴을 보아
라./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여기는/지상./연민한 삶의 길이여./내 신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