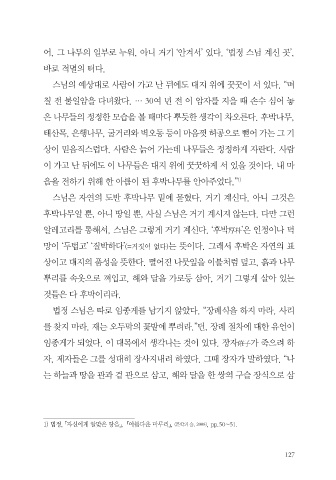Page 129 - 고경 - 2018년 9월호 Vol. 65
P. 129
어, 그 나무의 일부로 누워, 아니 거기 ‘안겨서’ 있다. ‘법정 스님 계신 곳’,
바로 적멸의 터다.
스님의 예상대로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대지 위에 꿋꿋이 서 있다. “며
칠 전 불일암을 다녀왔다. … 30여 년 전 이 암자를 지을 때 손수 심어 놓
은 나무들의 정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차오른다. 후박나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와 벽오동 등이 마음껏 허공으로 뻗어 가는 그 기
상이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늙어 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란다. 사람
이 가고 난 뒤에도 이 나무들은 대지 위에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내 마
음을 전하기 위해 한 아름이 된 후박나무를 안아주었다.” 1)
스님은 자연의 도반 후박나무 밑에 묻혔다. 거기 계신다. 아니 그것은
후박나무일 뿐, 아니 땅일 뿐, 사실 스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다만 그런
알레고리를 통해서, 스님은 그렇게 거기 계신다. ‘후박厚朴’은 인정이나 덕
망이 ‘두텁고’ ‘질박하다’(=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후박은 자연의 표
상이고 대지의 품성을 뜻한다. 떨어진 나뭇잎을 이불처럼 덮고, 흙과 나무
뿌리를 속옷으로 껴입고, 해와 달을 가로등 삼아, 거기 그렇게 살아 있는
것들은 다 후박이리라.
법정 스님은 따로 임종게를 남기지 않았다. “장례식을 하지 마라. 사리
를 찾지 마라. 재는 오두막의 꽃밭에 뿌려라.”던, 장례 절차에 대한 유언이
임종게가 되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장자莊子가 죽으려 하
자, 제자들은 그를 성대히 장사지내려 하였다. 그때 장자가 말하였다. “나
는 하늘과 땅을 관과 겉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구슬 장식으로 삼
1) 법정,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아름다운 마무리』, (문학의 숲, 2008), pp.50~5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