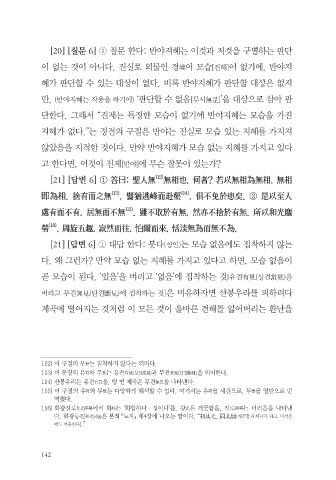Page 144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44
[20] [질문 6] ① 질문 한다: 반야지혜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판단
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외물인 경境이 모습[견해]이 없기에, 반야지
혜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비록 반야지혜가 판단할 대상은 없지
만, (반야지혜는 작용을 하기에) ‘판단할 수 없음[무시無是]’을 대상으로 삼아 판
단한다. 그래서 “진제는 특정한 모습이 없기에 반야지혜는 모습을 가진
지혜가 없다.”는 경전의 구절은 반야는 진실로 모습 있는 지혜를 가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반야지혜가 모습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고 한다면, 이것이 진제[반야]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112)
[21] [답변 6] ① 答曰: 聖人無 無相也. 何者? 若以無相為無相, 無相
113)
114)
即為相. 捨有而之無 , 譬猶逃峰而赴壑 , 俱不免於患矣. ② 是以至人
115)
處有而不有, 居無而不無 . 雖不取於有無, 然亦不捨於有無. 所以和光塵
116)
勞 , 周旋五趣, 寂然而往, 怕爾而來, 恬淡無為而無不為.
[21] [답변 6] ① 대답 한다: 붓다(성인)는 모습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다. 왜 그런가? 만약 모습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습 없음이
곧 모습이 된다. ‘있음’을 버리고 ‘없음’에 집착하는 것[유견有見(상견常見)을
버리고 무견無見(단견斷見)에 집착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산봉우리를 피하려다
계곡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견해를 잃어버리는 환난을
112) 이 구절의 무無는 집착하지 않다는 의미다.
113) 이 문장의 유有와 무無는 유견有見(상견常見)과 무견無見(단견斷見)을 의미한다.
114) 산봉우리는 유견有見을, 텅 빈 계곡은 무견無見을 나타낸다.
115) 이 구절의 유有와 무無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有를 세간으로, 무無를 열반으로 번
역했다.
116) 화광진로化光塵勞에서 화和는 ‘화합하다·섞이다’를, 광光은 깨끗함을, 진로塵勞는 더러움을 나타낸
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은 본래 『노자』 제4장에 나오는 말이다. “和其光, 同其塵[깨끗함과 하나가 되고, 더러움
에도 어울린다].”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