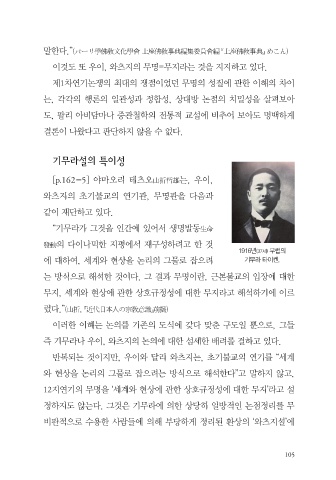Page 107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07
말한다.”(パーリ學佛敎文化學會 上座佛敎事典編集委員會編 『上座佛敎事典』 めこん)
이것도 또 우이, 와츠지의 무명=무지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제1차연기논쟁의 최대의 쟁점이었던 무명의 성질에 관한 이해의 차이
는, 각각의 행론의 일관성과 정합성, 상대방 논점의 치밀성을 살펴보아
도, 팔리 아비담마나 중관철학의 전통적 교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게
결론이 나왔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라설의 특이성
[p.162-5] 야마오리 테츠오山折哲雄는, 우이,
와츠지의 초기불교의 연기관, 무명관을 다음과
같이 재단하고 있다.
“기무라가 그것을 인간에 있어서 생명발동生命
· 發動의 다이나믹한 지평에서 재구성하려고 한 것
1916년(37세) 무렵의
에 대하여, 세계와 현상을 논리의 그물로 잡으려 기무라 타이켄.
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 결과 무명이란, 근본불교의 입장에 대한
무지, 세계와 현상에 관한 상호규정성에 대한 무지라고 해석하기에 이르
렀다.”(山折, 『近代日本人の宗敎意識』前揭)
이러한 이해는 논의를 기존의 도식에 갖다 맞춘 구도일 뿐으로, 그들
즉 기무라나 우이, 와츠지의 논의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결하고 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이와 달리 와츠지는, 초기불교의 연기를 “세계
와 현상을 논리의 그물로 잡으려는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고,
12지연기의 무명을 ‘세계와 현상에 관한 상호규정성에 대한 무지’라고 설
정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기무라에 의한 상당히 일방적인 논점정리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정리된 환상의 ‘와츠지설’에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