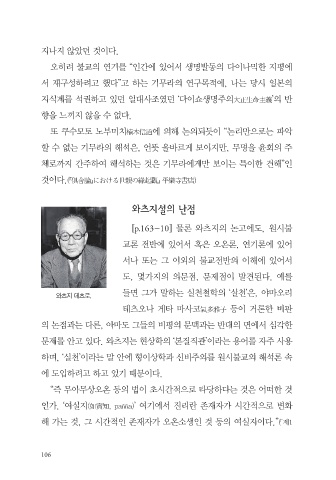Page 108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08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불교의 연기를 “인간에 있어서 생명발동의 다이나믹한 지평에
서 재구성하려고 했다”고 하는 기무라의 연구목적에, 나는 당시 일본의
지식계를 석권하고 있던 일대사조였던 ‘다이쇼생명주의大正生命主義’의 반
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쿠수모토 노부미치楠本信道에 의해 논의되듯이 “논리만으로는 파악
할 수 없는 기무라의 해석은, 언뜻 올바르게 보이지만, 무명을 윤회의 주
체로까지 간주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무라에게만 보이는 특이한 견해”인
것이다.(『俱舍論』における世親の緣起觀』 平樂寺書店)
와츠지설의 난점
[p.163-10] 물론 와츠지의 논고에도, 원시불
교론 전반에 있어서 혹은 오온론, 연기론에 있어
서나 또는 그 이외의 불교전반의 이해에 있어서
도, 몇가지의 의문점,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그가 말하는 실천철학의 ‘실천’은, 야마오리
와츠지 데츠로.
테츠오나 게타 마사코氣多雅子 등이 거론한 비판
의 논점과는 다른, 아마도 그들의 비평의 문맥과는 반대의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와츠지는 현상학의 ‘본질직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
하며, ‘실천’이라는 말 안에 형이상학과 신비주의를 원시불교의 해석론 속
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아무상오온 등의 법이 초시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
인가. ‘여실지(如實知, pañña)’ 여기에서 진리란 존재자가 시간적으로 변화
해 가는 것, 그 시간적인 존재자가 오온소생인 것 등의 여실지이다.”(「제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