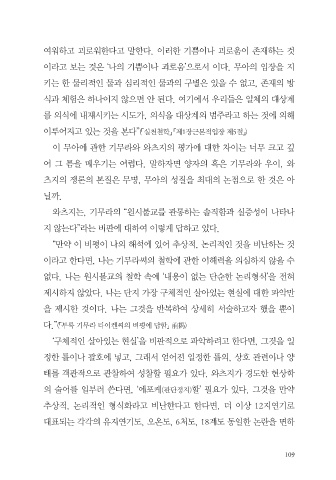Page 111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11
여워하고 괴로워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쁨이나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
이라고 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나 괴로움’으로서 이다. 무아의 입장을 지
키는 한 물리적인 물과 심리적인 물과의 구별은 있을 수 없고, 존재의 방
식과 체험은 하나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일체의 대상계
를 의식에 내재시키는 시도가, 의식을 대상계의 범주라고 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실천철학」 「제1장근본적입장 제5절」)
이 무아에 관한 기무라와 와츠지의 평가에 대한 차이는 너무 크고 깊
어 그 틈을 메우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양자의 혹은 기무라와 우이, 와
츠지의 쟁론의 본질은 무명, 무아의 성질을 최대의 논점으로 한 것은 아
닐까.
와츠지는, 기무라의 “원시불교를 관통하는 솔직함과 실증성이 나타나
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다.
“만약 이 비평이 나의 해석에 있어 추상적, 논리적인 것을 비난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무라씨의 철학에 관한 이해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원시불교의 철학 속에 ‘내용이 없는 단순한 논리형식’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가장 구체적인 살아있는 현실에 대한 파악만
을 제시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반복하여 상세히 서술하고자 했을 뿐이
다.”(「부록 기무라 타이켄씨의 비평에 답함」 前揭)
‘구체적인 살아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일
정한 틀이나 괄호에 넣고, 그래서 얻어진 일정한 틀의, 상호 관련이나 양
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다. 와츠지가 경도한 현상학
의 술어를 일부러 쓴다면, ‘에포케(판단정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만약
추상적, 논리적인 형식화라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12지연기로
대표되는 각각의 유지연기도, 오온도, 6처도, 18계도 동일한 논란을 면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