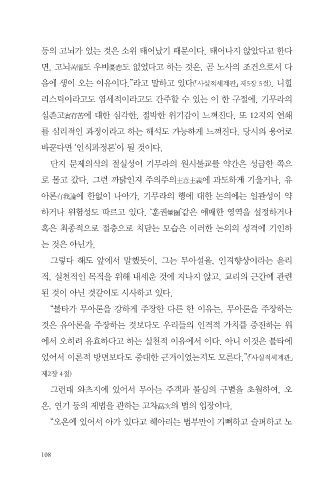Page 110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110
등의 고뇌가 있는 것은 소위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면, 고뇌苦惱도 우비憂悲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곧 노사의 조건으로서 다
음에 생이 오는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사실적세계관」 제5장 5절). 니힐
리스틱이라고도 염세적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 이 한 구절에, 기무라의
실존고實存苦에 대한 심각한,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진다. 또 12지의 연쇄
를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느껴진다. 당시의 용어로
바꾼다면 ‘인식과정론’이 될 것이다.
단지 문제의식의 절실성이 기무라의 원시불교를 약간은 성급한 쪽으
로 몰고 갔다. 그런 까닭인지 주의주의主意主義에 과도하게 기울거나, 유
아론有我論에 한없이 나아가, 기무라의 행에 대한 논의에는 일관성이 약
하거나 위험성도 따르고 있다. ‘훈권暈圈’같은 애매한 영역을 설정하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절충으로 치닫는 모습은 이러한 논의의 성격에 기인하
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해도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무아설을, 인격향상이라는 윤리
적,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고, 교리의 근간에 관련
된 것이 아닌 것같이도 시사하고 있다.
“불타가 무아론을 강하게 주장한 다른 한 이유는, 무아론을 주장하는
것은 유아론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인격적 가치를 증진하는 위
에서 오히려 유효하다고 하는 실천적 이유에서 이다. 아니 이것은 불타에
있어서 이론적 방면보다도 중대한 근거이었는지도 모른다.”(「사실적세계관」
제2장 4절)
그런데 와츠지에 있어서 무아는 주객과 물심의 구별을 초월하여, 오
온, 연기 등의 제법을 관하는 고차高次의 법의 입장이다.
“오온에 있어서 아가 있다고 헤아리는 범부만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