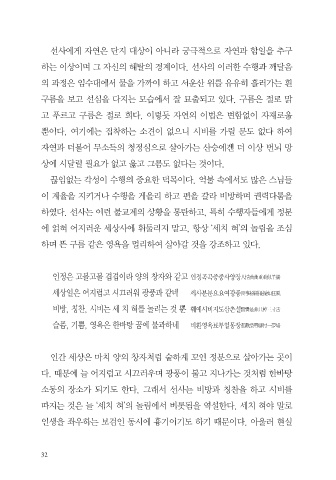Page 34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34
선사에게 자연은 단지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연과 합일을 추구
하는 이상이며 그 자신의 해탈의 경계이다. 선사의 이러한 수행과 깨달음
의 과정은 임수대에서 물을 가까이 하고 서운산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고 선심을 다지는 모습에서 잘 묘출되고 있다. 구름은 절로 맑
고 푸르고 구름은 절로 희다. 이렇듯 자연의 이법은 변함없이 자재로울
뿐이다. 여기에는 집착하는 소견이 없으니 시비를 가릴 문도 없다 하여
자연과 더불어 무소득의 청정심으로 살아가는 산승에겐 더 이상 번뇌 망
상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옳고 그름도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각성이 수행의 중요한 덕목이다. 억불 속에서도 많은 스님들
이 계율을 지키거나 수행을 게을리 하고 편을 갈라 비방하며 권력다툼을
하였다. 선사는 이런 불교계의 상황을 통탄하고, 특히 수행자들에게 정분
에 얽혀 어지러운 세상사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세치 혀’의 놀림을 조심
하며 뜬 구름 같은 영욕을 멀리하여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정은 고불고불 겹겹이라 양의 창자와 같고 인정곡곡중중사양장人情曲曲重重似羊腸
세상일은 어지럽고 시끄러워 광풍과 같네 세사분분요요여광풍世事紛紛擾擾如狂風
비방, 칭찬, 시비는 세 치 혀를 놀리는 것 뿐 훼예시비지도삼촌설毁譽是非只棹三寸舌
슬픔, 기쁨, 영욕은 한바탕 꿈에 불과하네 비환영욕료부일몽장悲歡榮辱聊付一夢場
인간 세상은 마치 양의 창자처럼 숱하게 꼬인 정분으로 살아가는 곳이
다. 때문에 늘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광풍이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한바탕
소동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선사는 비방과 칭찬을 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은 늘 ‘세치 혀’의 놀림에서 비롯됨을 역설한다. 세치 혀야 말로
인생을 좌우하는 보검인 동시에 흉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