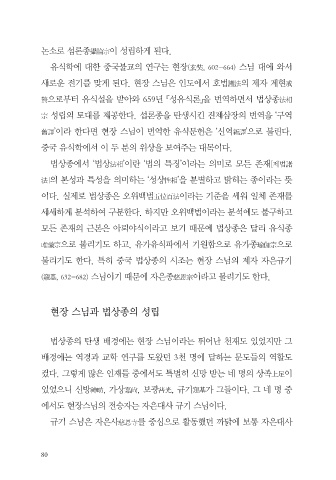Page 82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82
논소로 섭론종攝論宗이 성립하게 된다.
유식학에 대한 중국불교의 연구는 현장(玄奘, 602-664) 스님 대에 와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호법護法의 제자 계현戒
贅으로부터 유식설을 받아와 659년 『성유식론』을 번역하면서 법상종法相
宗 성립의 토대를 제공한다. 섭론종을 탄생시킨 진제삼장의 번역을 ‘구역
舊譯’이라 한다면 현장 스님이 번역한 유식문헌은 ‘신역新譯’으로 불린다.
중국 유식학에서 이 두 분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상종에서 ‘법상法相’이란 ‘법의 특징’이라는 의미로 모든 존재[제법諸
法]의 본성과 특성을 의미하는 ‘성상性相’을 분별하고 밝히는 종이라는 뜻
이다. 실제로 법상종은 오위백법五位百法이라는 기준을 세워 일체 존재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구분한다. 하지만 오위백법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의 근본은 아뢰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상종은 달리 유식종
唯識宗으로 불리기도 하고, 유가유식파에서 기원함으로 유가종瑜伽宗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중국 법상종의 시조는 현장 스님의 제자 자은규기
(窺基, 632-682) 스님이기 때문에 자은종慈恩宗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장 스님과 법상종의 성립
법상종의 탄생 배경에는 현장 스님이라는 뛰어난 천재도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역경과 교학 연구를 도왔던 3천 명에 달하는 문도들의 역할도
컸다. 그렇게 많은 인재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망 받는 네 명의 상족上足이
있었으니 신방神昉, 가상嘉尙, 보광普光, 규기窺基가 그들이다. 그 네 명 중
에서도 현장스님의 전승자는 자은대사 규기 스님이다.
규기 스님은 자은사慈恩寺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까닭에 보통 자은대사
80